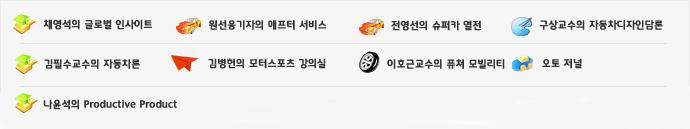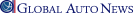현대차 YF쏘나타와 아반떼 MD 디자인, 그리고 소통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10-07-27 02:56:58 |
본문
얼마 전에 신형 아반떼의 실내 디자인이 공개됐다. 지금껏 차체 외부 디자인만이 공개돼서 실내의 디자인이 어떨 것인가에 모두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드디어 파격적인 이미지의 실내 디자인이 공개된 것이다. 동양 철학에 입각한 ‘바람이 빚은 형태’라는 슬로건을 내건 신형 아반떼의 차체 디자인에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독창성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보였고, 그런 이유에서 신형 아반떼의 실내 디자인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일까 기대를 가졌기에 궁금증은 더 컸었다.
게다가 새로운 현대, 기아 차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국내 뿐 아니라,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도 뜨겁다. 여러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때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그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 뿌듯하고 기쁘다.
아마도 자동차는 여러 종류의 공업제품들 중에서 해외로 수출되어서 직간접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제품이 틀림없을 것이다. 자동차는 부피가 클 뿐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자사의 새 차를 출현시키는, 이른바 PPL(Product Placement) 마케팅이라는 간접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일본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절대로 자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자동차기술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 국가가 됐다. 남한만으로 본다면 미국의 100분의 1정도 되는 국토 크기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국가가 됐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일본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아직은 일본을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다가,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자동차 기술과 부품, 그리고 도면은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고, 설계와 디자인 방법도 일본을 통해 어깨너머로 배웠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1세기가 된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몇몇 중요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1세기의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부품을 100% 국산화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국적성(國籍性)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적성이란, 바로 한국차의 특징을 말한다. 우리가 독일의 차에서 발견하는 장점과 일본의 차에서 발견하는 장점은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어느 나라의 차를 좋게 평가하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적성은 비단 기술적인 하드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 소프트웨어, 즉 디자인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글로벌 전략에 의해 부품이나 기술의 개발이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21세기의 자동차는 하드웨어보다는 바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의해 평가되고 선택된다. 그만큼 고유한 디자인의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을 ‘응용미술’ 이라고 해서, 마치 ‘순수예술’의 하위개념 정도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빵떡모자를 쓰고 담배 파이프를 문 채로 여유 있게 작품을 창조하는 모습의 ‘예술가’들에 비해, 자와 컴퍼스를 써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들은 기량이 부족한 어설픈 화가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작업은 그림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자동차 그림’이 정말로 ‘시동 걸리는 자동차’가 되려면, 디자이너들에게는 ‘그림’의 차원을 뛰어넘는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디자이너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는,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예술적 직관(直觀)으로 여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를 ‘창조’하는 작업과, 또 그 형태를 설계 조건이나 안전성 요구에 맞추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세세한 작업도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작업들 중에는 디자인 창조 작업의 객관성(客觀性)을 높이려는 활동도 또한 포함된다.
그렇다면 디자인 작업에서의 객관성은 무엇일까? 지금 필자는 자동차 디자인이 예술적 차원의 작업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로 실현된 상태에서의 디자인은 더 이상 ‘예술’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자동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는 인명을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만들어진 디자인은 당연히 객관성을 가진 조형이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보면 회화나 조각품은 그 작품을 소장할 단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된다. 언제나 ‘예술작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량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대개는 몇 십만 대, 때로는 몇 백만 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 숫자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작가(디자이너)의 ‘주관대로’, 혹은 ‘예술적’으로만 디자인하기에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술가’들은 대중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주관에서 나오는 창의성이 바로 그들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작품들도 ‘예술품’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창의성이 요구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예술’에서 끝나서는 곤란한지도 모른다. 자동차는 개인의 취향대로 수집해서 갤러리나 거실에 걸어두는 ‘예술품’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 조형작업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나온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미적 감각과 가치관을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 조형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조형물이 되려면,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소통(疏通)’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소통’은 한쪽이 가진 생각을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견의 폭을 최소한으로 좁히려는 노력이다. 소통의 영어 해석은 good understanding, ‘훌륭한 이해’이다. 영어 단어 understanding은 문자 그대로 under, 아래쪽에, 그리고 standing은 선다는 의미로써, 상대방이 서 있는 아래,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필자는 왜 ‘한 칼 휘두른’ 아반떼의 실내에서 독특하긴 하지만,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은 목도리도마뱀이 연상되는 걸까? 필자는 진심으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메이저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썼다. 현대차가 잘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면, 굳이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현대, 기아 차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국내 뿐 아니라,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도 뜨겁다. 여러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때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그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 뿌듯하고 기쁘다.
아마도 자동차는 여러 종류의 공업제품들 중에서 해외로 수출되어서 직간접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 제품이 틀림없을 것이다. 자동차는 부피가 클 뿐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자사의 새 차를 출현시키는, 이른바 PPL(Product Placement) 마케팅이라는 간접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일본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절대로 자국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자동차기술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 국가가 됐다. 남한만으로 본다면 미국의 100분의 1정도 되는 국토 크기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국가가 됐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 일본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아직은 일본을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다가,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자동차 기술과 부품, 그리고 도면은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고, 설계와 디자인 방법도 일본을 통해 어깨너머로 배웠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1세기가 된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몇몇 중요 부품과 기술은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1세기의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부품을 100% 국산화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국적성(國籍性)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적성이란, 바로 한국차의 특징을 말한다. 우리가 독일의 차에서 발견하는 장점과 일본의 차에서 발견하는 장점은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어느 나라의 차를 좋게 평가하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적성은 비단 기술적인 하드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 소프트웨어, 즉 디자인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글로벌 전략에 의해 부품이나 기술의 개발이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21세기의 자동차는 하드웨어보다는 바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의해 평가되고 선택된다. 그만큼 고유한 디자인의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을 ‘응용미술’ 이라고 해서, 마치 ‘순수예술’의 하위개념 정도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빵떡모자를 쓰고 담배 파이프를 문 채로 여유 있게 작품을 창조하는 모습의 ‘예술가’들에 비해, 자와 컴퍼스를 써서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들은 기량이 부족한 어설픈 화가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작업은 그림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자동차 그림’이 정말로 ‘시동 걸리는 자동차’가 되려면, 디자이너들에게는 ‘그림’의 차원을 뛰어넘는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디자이너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는,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예술적 직관(直觀)으로 여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를 ‘창조’하는 작업과, 또 그 형태를 설계 조건이나 안전성 요구에 맞추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세세한 작업도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작업들 중에는 디자인 창조 작업의 객관성(客觀性)을 높이려는 활동도 또한 포함된다.
그렇다면 디자인 작업에서의 객관성은 무엇일까? 지금 필자는 자동차 디자인이 예술적 차원의 작업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로 실현된 상태에서의 디자인은 더 이상 ‘예술’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자동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는 인명을 다루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만들어진 디자인은 당연히 객관성을 가진 조형이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보면 회화나 조각품은 그 작품을 소장할 단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된다. 언제나 ‘예술작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량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대개는 몇 십만 대, 때로는 몇 백만 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 숫자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작가(디자이너)의 ‘주관대로’, 혹은 ‘예술적’으로만 디자인하기에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술가’들은 대중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주관에서 나오는 창의성이 바로 그들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작품들도 ‘예술품’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디자이너들은 창의성이 요구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예술’에서 끝나서는 곤란한지도 모른다. 자동차는 개인의 취향대로 수집해서 갤러리나 거실에 걸어두는 ‘예술품’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 조형작업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나온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미적 감각과 가치관을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 조형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조형물이 되려면,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소통(疏通)’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소통’은 한쪽이 가진 생각을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견의 폭을 최소한으로 좁히려는 노력이다. 소통의 영어 해석은 good understanding, ‘훌륭한 이해’이다. 영어 단어 understanding은 문자 그대로 under, 아래쪽에, 그리고 standing은 선다는 의미로써, 상대방이 서 있는 아래,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필자는 왜 ‘한 칼 휘두른’ 아반떼의 실내에서 독특하긴 하지만,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은 목도리도마뱀이 연상되는 걸까? 필자는 진심으로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메이저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썼다. 현대차가 잘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면, 굳이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