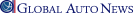데스크 | 1967 포르쉐 911 시승기 |
페이지 정보
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ㅣ 사진 : 한상기(hskm3@hanmail.net)|
|
승인 2013-10-21 02:06:18 |
본문
아주 잠깐이지만 초대 포르쉐 911을 운전해 볼 수 있었다. 코드네임 901의 초대 911은 생각보다 나긋나긋하고 운전하기도 어렵지 않다. 시대의 차이를 감안하면 901의 완성도는 놀라운 수준이고, 특유의 공랭식 엔진 사운드는 지금 911보다 구수하다. 박물관에서 나온 튀어나온 차지만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 차는 지금도 200km/h를 찍는다고 한다. 901을 보니 포르쉐가 얼마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 수 있다.
글 / 한상기 (프리랜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사진 / 한상기 (프리랜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슈투트가르트 모터스 제공
오늘날 포르쉐 911의 성공은 자동차 업계의 미스테리 수준이다. 포르쉐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유명 모델이니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이런 형태의 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잘 알려진 것처럼 911은 엔진이 리어 액슬 뒤에 배치된 RR 방식이다. 요즘에 이런 형태의 차가 거의 없다. 아니 사라진지 오래다. 엔진이 리어 액슬 뒤에 있으면 무게 배분에서 불리해지고 911 같은 스포츠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마디로 롱런하기 힘든 패키징이다. 몇몇 시티카를 제외한다면 911만 이 패키징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911의 리어 엔진 배치는 이제 와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것은 911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 계속 성능을 높여야 하는 포르쉐 엔지니어로서는 그들의 선배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과감하게 리어 엔진을 바꾸지 못했냐고. 이렇게 오랜 기간 굳어진 전통은 이 차를 만드는 포르쉐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911은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브랜드의 얼굴 마담이다. 911이 포르쉐이고, 포르쉐가 911이다. 911 때문에 포르쉐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지금이야 카이엔이 더 많이 팔리지만 911이 없는 포르쉐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고객 충성도가 높은 모델 중 하나가 바로 911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초대 911이 데뷔했다. 포르쉐가 독자적인 스포츠카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때는 1956년이었다. 초기 프로젝트 네임은 타입 7이었으며, 이후 901로 바뀌었다. 하지만 푸조가 이미 가운데 0이 들어간 세 자리 숫자를 상표 등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명을 911로 바꿔야 했다.
911 프로젝트에는 보디 엔지니어인 어윈 코멘다와 엔진 개발 담당 잉 한스 토말라가 주도했고 막바지에는 페르디난트 피에흐도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페리 포르쉐의 아들이자 작년에 세상을 떠난 부치가 스타일링을 맡았다. 이때의 스타일링은 지금도 911의 바탕이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디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은 페리 포르쉐가 했다. 오버헤드 엔진과 2+2 시트 배치도 그의 결정이다. 356의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디 엔지니어 코멘다는 당초 4인승 컨셉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페리는 356과 같은 RR 배치도 프런트 엔진보다 레이싱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페리 포르쉐의 요구대로 차가 완성됐고 이 차는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래서 페리 포르쉐를 911의 아버지로 부르기도 한다.
911의 스타일링은 356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기저항계수는 0.40에서 0.381로 좋아졌고 한층 보기 좋은 모습이 됐다. 개구리눈으로 대표되는 프런트 엔드의 스타일링은 지금까지도 포르쉐의 얼굴로 인식된다. 엔진이 뒤에 얹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은 40:60이 됐다.
356에서 확 바뀐 게 있다면 엔진이다. 공랭식 수평대향인 것은 같지만 엔진 헤드가 푸시로드에서 오버헤드로 바뀌었다. 2리터 엔진의 출력은 130마력.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높은 리터당 출력이었다. 드라이 섬프 윤활 시스템을 채택해 무게 중심을 더욱 낮춘 것도 포인트이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도 356의 스윙 액슬에서 세미 트레일링 암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
1965년에는 보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912도 나온다. 912는 6기통 대신 수평대향 4기통 1.6리터 엔진을 얹은 모델이다. 하지만 판매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2리터 엔진은 1966년에 160마력 사양이 나왔고 1970년에 2.2리터로 업그레이드 됐다.
타입 901의 2리터 엔진은 1,991cc 배기량에 130마력의 힘을 냈다. 헤드와 크랭크케이스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며 크랭크샤프트도 단조였다. 거기다 배기 밸브는 속이 빈 중공 타입이었고 냉각 성능을 감안해 나트륨까지 함유시켰다. 130마력에 비해 기본 바탕이 높았다. 기본적으로는 2리터지만 2.7리터까지 확대할 것을 감안한 설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배기량이 3.8리터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포르쉐 911 50주년의 해이다. 포르쉐 본사는 911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911 월드 투어 행사를 펼치고 있다. 각 국을 돌며 초대 911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위해 박물관에 고이 모셔둔 1967 911을 꺼냈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도 찾아왔다. 초대 911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차체의 허리 라인에는 올해 들어 각 나라를 순방한 흔적이 가지런히 붙어 있다. 눈앞에 있는 911는 박물관을 나와서 슈투트가르트 포르쉐 테니스 그랑프리, 파리의 레트로모빌, 제네바 모터쇼, 영국의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미국 페블비치, 상하이의 포르쉐 패시네이션 등의 행사를 순방해 왔다.
외관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현재 모델과 똑같다. 기본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안 바뀔 수도 있나 싶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지만 실루엣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초대 모델을 보면 현재 911 디자인이 전통에 맞춰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의 디테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개구리눈으로 불리는 헤드램프는 참으로 정겹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이며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유명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닌가 싶다. 지금 모델과는 달리 헤드램프의 각도가 곧추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윈드실드도 마찬가지이다. 각도가 높다. 996을 제외한다면 911의 헤드램프는 항상 라운드였다.
외관의 특징 중 하나는 크롬 장식이다. 크롬 장식이 의외로 많다. 범퍼와 헤드램프, 윈도우 프레임까지 크롬이 적용됐다. 확실히 크롬도 사용하기 나름이다. 이 911의 크롬은 클래식하면서도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다. 미국형이어서 그런지 앞뒤에는 보조 범퍼가 달려 있다. 옛날 미국차의 보조 범퍼는 별로 예쁘지가 않은데 911은 이것조차 멋스럽다.
뒷모습도 현재 모델과 같은 실루엣이다. 낮게 내려앉은 엉덩이나 엔진 커버는 오히려 지금 911보다 낫다. 장식도 없는 싱글 머플러는 조금 왜소해 보인다. 엔진 커버를 열면 원조 수평대향 6기통이 모습을 드러낸다. 애초에 최대 2.7리터까지 확대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남는다. 나중에 배기량이 3리터가 넘는 엔진을 보면 위에서는 손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확실히 엔진 위치가 낮다. 측면의 엔진 블록을 보면 웨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과거에 카뷰레터를 공급하던 업체의 이름이다.
약간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앞에 있는 트렁크이다. 긴 보닛을 열면 딱 그만큼의 공간이 나온다. 요즘 차는 전장품 때문에 앞의 트렁크가 작은데, 이 911은 윈드실드 앞까지 전부 트렁크 공간으로 쓴다. 얕긴 하지만 꽤나 큰 공간이다. 개조를 해서 트렁크 리프트가 가스식인 게 이채롭다. 타이어는 165/80R/15 사이즈이다. 편평비 80은 요즘에는 볼 수 없는 타이어다.
911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 탈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이다. 이 말은 불편하지 않다는 뜻도 된다. 시트에 착석해 보니 과연 이 전통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타고 내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앉았을 때의 느낌은 승용차 같고, 거기다 시야도 좋다.
시트는 요즘과 달리 굴곡이 없다. 좌우 서포트가 밋밋한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트였을 것이다. 편하고 몸의 굴곡과 잘 붙는 느낌은 요즘과 비슷하다.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 시트 가죽도 여전히 생생하다. 60년대에는 헤드레스트가 없는 차도 있었다. 911은 헤드레스트가 있는 것은 물론 생긴 것도 독특하다. 꼭 베개처럼 생겼다.
여전히 남아 있는 전통이라면 왼쪽에 있는 이그니션,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이다. 5개의 원형 게이지가 늘어선 계기판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왼쪽부터 연료 게이지와 수온, 타코미터, 속도계, 시계이다. 역시 가운데 박힌 타코미터가 가장 크다. 미국형이어서 속도계는 마일로 표기돼 있고 최대 150MPH 스케일이다. 각 게이지마다 VDO 로고가 박혀 있는 게 눈에 띈다.
스티어링은 마치 트럭처럼 크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스포츠카 같지 않다. 이때는 파워 스티어링이 없었으니 이보다 작으면 돌리는데 힘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운전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 로터스 엑시즈보다는 가볍고 옛날 프라이드보다는 조금 무거운 수준이다. 나비의 날개 같은 레버는 경적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소리가 잘 난다.
이렇게 옛날 차는 당연히 깡통일건데, 의외로 알듯 모를 듯한 레버가 많다. 운전대 왼쪽에 있는 검은색 레버는 헤드램프이고 기어 레버 앞에 있는 작은 레버는 초크이다. 카뷰레터 엔진이기 때문에 초크가 필요하다. 에어컨은 없지만 앞유리에 외부 공기를 방출하는 벤트도 있다. 라디오 디자인도 그야말로 클래식하다. AM이 2개, FM이 3개이다. 이때에도 FM 채널이 더 많았나 싶다. 그리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알루미늄 트림이 상당히 고급스럽다. 글로브박스도 꽤 쓸 만한 용량이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실용적인 스포츠카라는 성격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2열이 좁은 건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911의 +2 좌석은 사람이 앉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간편하게 골프백 또는 짐을 놓을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이것도 911의 전통이 됐다.
시동은 약간 어렵게 걸린다. 오래된 수평대향 6기통 엔진은 공회전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소리를 낸다. 엔진 소리만 들으면 달리는데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잘 달린다. 1단 기어비가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속 토크는 좀 모자란 것 같다. 어느 정도는 회전수를 유지해야 한다. 싱글 오버헤드 방식으로 최고 출력이 6,000 rpm 넘어서 나오는 것도 비범한 일이다. 요즘 기준으로 봐도 높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포르쉐의 공랭식 사운드의 원조가 여기 있다. 푸드득 대거나 혹은 털털대거나 글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단히 푸근한 사운드인 것만은 분명하다. 요즘의 911을 생각하면 이 911의 엔진 사운드는 전원일기의 인트로만큼이나 구수하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볼륨이 크지 않다. 현재의 911과 같이 놓고 보면 엔진 사운드는 더 크다고 한다.
클러치와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상당히 붙어 있다. 특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힐 & 토를 하기 좋게 배치돼 있다. 클러치는 유격이 깊은 편이다. 붙고 떨어지는 시점이 한참 나중에 있다. 페달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미트 되는 시점을 찾는 것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대신 수동 기어의 감각을 짧은 시간에 익히기는 다소 무리이다. 보통 수동 기어는 가장 왼쪽으로 젖혀서 위로 올리면 1단인데, 초대 911은 보통 2단의 자리가 1단이다. 그래서 꼭 2단으로 출발하는 것 같다. 보통 1단 자리는 후진이다. 중립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보면 유격이 꽤 크다. 대신 기어에 물려 들어가는 거리는 짧다. 물론 그래도 감각이 대단히 낯설다. 처음에는 2단을 넣으려다 4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귀한 차라서 일반적인 시승과는 거리가 먼 운전이었다. 짧은 코스에서 내본 속도는 60마일(약 96km/h) 이하였는데, 예상보다는 차가 가볍게 가속된다. 관리를 잘 해서 엔진 상태가 좋기도 하지만 차가 가벼운 이유도 있다. 차의 무게는 1톤을 조금 넘을 뿐이다. 옛날 기록을 보면 0→60마일 가속 시간은 8.3초이다. 이정도면 대략 요즘 기준으로 봐도 준수한 가속력이다. 서킷에서는 요즘도 200km/h를 기록한다고 한다.
스티어링 휠은 트럭처럼 크지만 감각은 대단히 정확하다. 생긴 것과는 따로 논다. 잠깐 운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멈춘 상태에서는 무겁지만 일단 움직이면 딱 원하는 만큼 머리가 움직인다. 이 운전대와 차체는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브레이크는 초기 유격이 매우 커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말랑하게 느껴지는 하체는 편평비 80 타이어에 비롯된다. 그래도 보디의 롤이 크지 않다. 보통 이렇게 오래된 차는 운전 자체가 어려운데, 이 911은 그렇지 않다. 수동 기어와 논 파워 스티어링이 낯설어서 그렇지 다루기가 쉬운 스포츠카이다. 그런데도 타기 어려운 스포츠카보다 빠르고 핸들링이 좋았던 차가 포르쉐 911이다. 그리고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막강한 아이덴티티와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역사상 수많은 명 스포츠카가 있었지만 911만큼 아이덴티티가 강렬하고 롱런한 차가 없었다. 포르쉐 911. 지구 대표 스포츠카의 이름이다.
글 / 한상기 (프리랜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사진 / 한상기 (프리랜서 자동차 칼럼니스트), 슈투트가르트 모터스 제공
오늘날 포르쉐 911의 성공은 자동차 업계의 미스테리 수준이다. 포르쉐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유명 모델이니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이런 형태의 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을 유지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잘 알려진 것처럼 911은 엔진이 리어 액슬 뒤에 배치된 RR 방식이다. 요즘에 이런 형태의 차가 거의 없다. 아니 사라진지 오래다. 엔진이 리어 액슬 뒤에 있으면 무게 배분에서 불리해지고 911 같은 스포츠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마디로 롱런하기 힘든 패키징이다. 몇몇 시티카를 제외한다면 911만 이 패키징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911의 리어 엔진 배치는 이제 와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것은 911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 계속 성능을 높여야 하는 포르쉐 엔지니어로서는 그들의 선배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과감하게 리어 엔진을 바꾸지 못했냐고. 이렇게 오랜 기간 굳어진 전통은 이 차를 만드는 포르쉐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911은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브랜드의 얼굴 마담이다. 911이 포르쉐이고, 포르쉐가 911이다. 911 때문에 포르쉐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지금이야 카이엔이 더 많이 팔리지만 911이 없는 포르쉐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고객 충성도가 높은 모델 중 하나가 바로 911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초대 911이 데뷔했다. 포르쉐가 독자적인 스포츠카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때는 1956년이었다. 초기 프로젝트 네임은 타입 7이었으며, 이후 901로 바뀌었다. 하지만 푸조가 이미 가운데 0이 들어간 세 자리 숫자를 상표 등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명을 911로 바꿔야 했다.
911 프로젝트에는 보디 엔지니어인 어윈 코멘다와 엔진 개발 담당 잉 한스 토말라가 주도했고 막바지에는 페르디난트 피에흐도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페리 포르쉐의 아들이자 작년에 세상을 떠난 부치가 스타일링을 맡았다. 이때의 스타일링은 지금도 911의 바탕이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디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은 페리 포르쉐가 했다. 오버헤드 엔진과 2+2 시트 배치도 그의 결정이다. 356의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디 엔지니어 코멘다는 당초 4인승 컨셉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페리는 356과 같은 RR 배치도 프런트 엔진보다 레이싱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페리 포르쉐의 요구대로 차가 완성됐고 이 차는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래서 페리 포르쉐를 911의 아버지로 부르기도 한다.
911의 스타일링은 356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기저항계수는 0.40에서 0.381로 좋아졌고 한층 보기 좋은 모습이 됐다. 개구리눈으로 대표되는 프런트 엔드의 스타일링은 지금까지도 포르쉐의 얼굴로 인식된다. 엔진이 뒤에 얹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은 40:60이 됐다.
356에서 확 바뀐 게 있다면 엔진이다. 공랭식 수평대향인 것은 같지만 엔진 헤드가 푸시로드에서 오버헤드로 바뀌었다. 2리터 엔진의 출력은 130마력.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히 높은 리터당 출력이었다. 드라이 섬프 윤활 시스템을 채택해 무게 중심을 더욱 낮춘 것도 포인트이다.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도 356의 스윙 액슬에서 세미 트레일링 암으로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
1965년에는 보급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912도 나온다. 912는 6기통 대신 수평대향 4기통 1.6리터 엔진을 얹은 모델이다. 하지만 판매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2리터 엔진은 1966년에 160마력 사양이 나왔고 1970년에 2.2리터로 업그레이드 됐다.
타입 901의 2리터 엔진은 1,991cc 배기량에 130마력의 힘을 냈다. 헤드와 크랭크케이스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며 크랭크샤프트도 단조였다. 거기다 배기 밸브는 속이 빈 중공 타입이었고 냉각 성능을 감안해 나트륨까지 함유시켰다. 130마력에 비해 기본 바탕이 높았다. 기본적으로는 2리터지만 2.7리터까지 확대할 것을 감안한 설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배기량이 3.8리터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포르쉐 911 50주년의 해이다. 포르쉐 본사는 911 데뷔 50주년을 기념해 911 월드 투어 행사를 펼치고 있다. 각 국을 돌며 초대 911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위해 박물관에 고이 모셔둔 1967 911을 꺼냈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도 찾아왔다. 초대 911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차체의 허리 라인에는 올해 들어 각 나라를 순방한 흔적이 가지런히 붙어 있다. 눈앞에 있는 911는 박물관을 나와서 슈투트가르트 포르쉐 테니스 그랑프리, 파리의 레트로모빌, 제네바 모터쇼, 영국의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미국 페블비치, 상하이의 포르쉐 패시네이션 등의 행사를 순방해 왔다.
외관을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현재 모델과 똑같다. 기본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안 바뀔 수도 있나 싶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지만 실루엣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초대 모델을 보면 현재 911 디자인이 전통에 맞춰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의 디테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개구리눈으로 불리는 헤드램프는 참으로 정겹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이며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유명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닌가 싶다. 지금 모델과는 달리 헤드램프의 각도가 곧추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윈드실드도 마찬가지이다. 각도가 높다. 996을 제외한다면 911의 헤드램프는 항상 라운드였다.
외관의 특징 중 하나는 크롬 장식이다. 크롬 장식이 의외로 많다. 범퍼와 헤드램프, 윈도우 프레임까지 크롬이 적용됐다. 확실히 크롬도 사용하기 나름이다. 이 911의 크롬은 클래식하면서도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다. 미국형이어서 그런지 앞뒤에는 보조 범퍼가 달려 있다. 옛날 미국차의 보조 범퍼는 별로 예쁘지가 않은데 911은 이것조차 멋스럽다.
뒷모습도 현재 모델과 같은 실루엣이다. 낮게 내려앉은 엉덩이나 엔진 커버는 오히려 지금 911보다 낫다. 장식도 없는 싱글 머플러는 조금 왜소해 보인다. 엔진 커버를 열면 원조 수평대향 6기통이 모습을 드러낸다. 애초에 최대 2.7리터까지 확대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남는다. 나중에 배기량이 3리터가 넘는 엔진을 보면 위에서는 손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 그리고 확실히 엔진 위치가 낮다. 측면의 엔진 블록을 보면 웨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과거에 카뷰레터를 공급하던 업체의 이름이다.
약간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앞에 있는 트렁크이다. 긴 보닛을 열면 딱 그만큼의 공간이 나온다. 요즘 차는 전장품 때문에 앞의 트렁크가 작은데, 이 911은 윈드실드 앞까지 전부 트렁크 공간으로 쓴다. 얕긴 하지만 꽤나 큰 공간이다. 개조를 해서 트렁크 리프트가 가스식인 게 이채롭다. 타이어는 165/80R/15 사이즈이다. 편평비 80은 요즘에는 볼 수 없는 타이어다.
911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 탈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이다. 이 말은 불편하지 않다는 뜻도 된다. 시트에 착석해 보니 과연 이 전통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타고 내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앉았을 때의 느낌은 승용차 같고, 거기다 시야도 좋다.
시트는 요즘과 달리 굴곡이 없다. 좌우 서포트가 밋밋한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트였을 것이다. 편하고 몸의 굴곡과 잘 붙는 느낌은 요즘과 비슷하다.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 시트 가죽도 여전히 생생하다. 60년대에는 헤드레스트가 없는 차도 있었다. 911은 헤드레스트가 있는 것은 물론 생긴 것도 독특하다. 꼭 베개처럼 생겼다.
여전히 남아 있는 전통이라면 왼쪽에 있는 이그니션,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이다. 5개의 원형 게이지가 늘어선 계기판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왼쪽부터 연료 게이지와 수온, 타코미터, 속도계, 시계이다. 역시 가운데 박힌 타코미터가 가장 크다. 미국형이어서 속도계는 마일로 표기돼 있고 최대 150MPH 스케일이다. 각 게이지마다 VDO 로고가 박혀 있는 게 눈에 띈다.
스티어링은 마치 트럭처럼 크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스포츠카 같지 않다. 이때는 파워 스티어링이 없었으니 이보다 작으면 돌리는데 힘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운전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 로터스 엑시즈보다는 가볍고 옛날 프라이드보다는 조금 무거운 수준이다. 나비의 날개 같은 레버는 경적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소리가 잘 난다.
이렇게 옛날 차는 당연히 깡통일건데, 의외로 알듯 모를 듯한 레버가 많다. 운전대 왼쪽에 있는 검은색 레버는 헤드램프이고 기어 레버 앞에 있는 작은 레버는 초크이다. 카뷰레터 엔진이기 때문에 초크가 필요하다. 에어컨은 없지만 앞유리에 외부 공기를 방출하는 벤트도 있다. 라디오 디자인도 그야말로 클래식하다. AM이 2개, FM이 3개이다. 이때에도 FM 채널이 더 많았나 싶다. 그리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알루미늄 트림이 상당히 고급스럽다. 글로브박스도 꽤 쓸 만한 용량이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실용적인 스포츠카라는 성격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2열이 좁은 건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911의 +2 좌석은 사람이 앉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간편하게 골프백 또는 짐을 놓을 목적으로 설계됐는데, 이것도 911의 전통이 됐다.
시동은 약간 어렵게 걸린다. 오래된 수평대향 6기통 엔진은 공회전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소리를 낸다. 엔진 소리만 들으면 달리는데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잘 달린다. 1단 기어비가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속 토크는 좀 모자란 것 같다. 어느 정도는 회전수를 유지해야 한다. 싱글 오버헤드 방식으로 최고 출력이 6,000 rpm 넘어서 나오는 것도 비범한 일이다. 요즘 기준으로 봐도 높은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포르쉐의 공랭식 사운드의 원조가 여기 있다. 푸드득 대거나 혹은 털털대거나 글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대단히 푸근한 사운드인 것만은 분명하다. 요즘의 911을 생각하면 이 911의 엔진 사운드는 전원일기의 인트로만큼이나 구수하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볼륨이 크지 않다. 현재의 911과 같이 놓고 보면 엔진 사운드는 더 크다고 한다.
클러치와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상당히 붙어 있다. 특히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은 힐 & 토를 하기 좋게 배치돼 있다. 클러치는 유격이 깊은 편이다. 붙고 떨어지는 시점이 한참 나중에 있다. 페달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 미트 되는 시점을 찾는 것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대신 수동 기어의 감각을 짧은 시간에 익히기는 다소 무리이다. 보통 수동 기어는 가장 왼쪽으로 젖혀서 위로 올리면 1단인데, 초대 911은 보통 2단의 자리가 1단이다. 그래서 꼭 2단으로 출발하는 것 같다. 보통 1단 자리는 후진이다. 중립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보면 유격이 꽤 크다. 대신 기어에 물려 들어가는 거리는 짧다. 물론 그래도 감각이 대단히 낯설다. 처음에는 2단을 넣으려다 4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귀한 차라서 일반적인 시승과는 거리가 먼 운전이었다. 짧은 코스에서 내본 속도는 60마일(약 96km/h) 이하였는데, 예상보다는 차가 가볍게 가속된다. 관리를 잘 해서 엔진 상태가 좋기도 하지만 차가 가벼운 이유도 있다. 차의 무게는 1톤을 조금 넘을 뿐이다. 옛날 기록을 보면 0→60마일 가속 시간은 8.3초이다. 이정도면 대략 요즘 기준으로 봐도 준수한 가속력이다. 서킷에서는 요즘도 200km/h를 기록한다고 한다.
스티어링 휠은 트럭처럼 크지만 감각은 대단히 정확하다. 생긴 것과는 따로 논다. 잠깐 운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멈춘 상태에서는 무겁지만 일단 움직이면 딱 원하는 만큼 머리가 움직인다. 이 운전대와 차체는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브레이크는 초기 유격이 매우 커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말랑하게 느껴지는 하체는 편평비 80 타이어에 비롯된다. 그래도 보디의 롤이 크지 않다. 보통 이렇게 오래된 차는 운전 자체가 어려운데, 이 911은 그렇지 않다. 수동 기어와 논 파워 스티어링이 낯설어서 그렇지 다루기가 쉬운 스포츠카이다. 그런데도 타기 어려운 스포츠카보다 빠르고 핸들링이 좋았던 차가 포르쉐 911이다. 그리고 그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막강한 아이덴티티와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역사상 수많은 명 스포츠카가 있었지만 911만큼 아이덴티티가 강렬하고 롱런한 차가 없었다. 포르쉐 911. 지구 대표 스포츠카의 이름이다.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