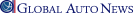다임러와 르노닛산의 제휴는 Sustainability를 위한 것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10-06-04 05:46:08 |
본문
다임러와 르노닛산의 제휴는 Sustainability를 위한 것
모터쇼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친환경차 대세’,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 경연의 장’. 마찬가지로 자동차회사들의 제휴관계나 인수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면 의례 ‘업계 재편성’이라는 제목이 등장한다. 이런 제목은 이제는 흔히 말하는 ‘낚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반복된다. 최근 다임러와 르노닛산이 제휴에 합의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합병을 통해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2009년 폭스바겐이 스즈키를 합병하고 2010년 들어 르노닛산 연합과 다임러의 협력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그 종착점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지 않았다. 업체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1위 메이커로 부상을 노린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세기에는 있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미국 메이커들이 자국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차회사들에게 ‘비용 저감(Cost Reduction)’은 숙명이 되었다. 그를 위해 부품회사를 옥죄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해 보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연간 100만대 이상은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1990년대 초 등장했다. 불과 몇 년 뒤 그것은 200만대 논리로 발전했고 1998년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세기의 합병은 400만대 논리의 결과로 정리됐다.
특히 서로 다른 세그먼트의 모델을 생산하는 메이커간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지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낳았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은 실패로 귀결됐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격차였고 두 번째는 문화적 괴리였다. 그것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경영하는 회사와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인 양산 메이커간의 어쩔 수 없는 갭이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르노닛산 연합과 GM의 제휴논의였다. 그 때는 1000만대 논리까지 발전했다. 결국은 무산됐지만 자동차회사들의 비용 저감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실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합집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칼 벤츠와 고트리프 다임러도 1926년 합병을 통해 다임러 벤츠가 됐다. 아우디도 네 개의 회사가 합해서 이루어진 회사다. 미국의 경우는 1920년대 300개가 넘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있었지만 1960년대 소위 말하는 빅3로 통합됐다.
이 후에도 규모의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 브랜드를 사들이거나 현지 생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를 확장해 갔다. 미국 메이커들은 주로 회사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한 반면 토요타 등 일본 메이커들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 미쓰비시간의 제휴 실패로 다임러는 큰 손실을 입었고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 역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GM은 많은 브랜드들을 정리해 4개로 집중하겠다고 선언했고 포드는 재규어와 랜드로버, 볼보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최근에 그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폭스바겐이다. 양산 브랜드인 세아트, 스코다를 비롯해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수퍼 럭셔리카 벤틀리, 람보르기니가 있고 여기에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일본 메이커 스즈키까지 끌어 들였다.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PSA푸조시트로엥과 한국의 현대기아 정도다. 르노와 닛산은 자본제휴관계로 완전 자회사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결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르노와 닛산의 CEO를 겸임하고 있는 브라질 태생 카를로스 곤의 행보는 GM과의 제휴논의 이후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초 다임러와의 전기차 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 상호 생산, 공동 구입,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한 기술의 공동 개발을 포함해 폭 넓은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용은 르노닛산은 다임러로부터 고급차용의 파워트레인을, 다임러는 르노닛산으로부터 소형차용 플랫폼의 공급을 받으면서 전기자동차 등의 개발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닛산은 인피니티 브랜드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현재 VQ 엔진은 오래돼어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임러와의 제휴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닛산은 소형차용 플랫폼을 다임러에 제공하고 그 대신 7단 AT 등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에 대해 닛산 자동차의 엔지니어들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EV기술은 소형 시티 커뮤터로서 사용되든지 혹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프랑스처럼 화력이 아닌 원자력에 의한 전기 생산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이미 세느 강변에 전기차를 취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의 CIVITAS(City VIT Ality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유럽 교통 프로그램과 프랑스 국내 LOTI법(1982년에 인권과 사회정책을 중시한 국내 교통 기본법)에 따라 컴팩트한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 배경 때문에 르노닛산은 전기차 개발에 다른 메이커보다 열심인 것이다.
물론 전기차의 개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와 닛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닛산만의 독자적인 기술영역의 필요성이다. 가솔린 직분터보와 디젤은 유럽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와 혼다가 선점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 르노와 닛산의 존재감을 크게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후발 양산 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인도의 마루티 스즈키가 생산하고 있는 A스타에 닛산의 엠블럼을 달고 픽소(Pixo)라는 이름으로 유럽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픽소는 도심형 시티카를 지향한다. 5도어 보디의 픽소는 전장×전폭×전고가 각각 3,565×1,470×1,600mm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 한 것이 특징. 휠베이스도 2,360mm로 전장 대비 상당히 길다. 엔진은 3기통 1리터 가솔린이 올라간다. 픽소는 인도 델리에서 생산된다.
르노는 또 그룹 내에 다치아라는 저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다치아는 루마니아에 있는 르노 자회사로 로간이라는 차를 7,000유로라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저가차 공세에 폭스바겐도 브라질산 폭스로 대항하려 하고 있지만 유럽시장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스즈키는 르노닛산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폭스바겐을 위한 저가차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인도가 소형차 생산 거점으로 될 수도 있다.
폭스바겐과 르노닛산 외에 현대기아 등도 인도를 소형차 생산에 좋은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사업환경 차이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인도에서는 영어가 통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역사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식도 중국보다는 크게 글로벌화되어 있다. 인도인들의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고 중국과 달리 창업도 자유롭다. 중국에서는 합작이 아니면 자동차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용 모델 이외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인도가 더 좋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을 간파한 카를로스 곤은 신형 닛산 마치를 태국과 멕시코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한 차체를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2012년까지 3,000 달러라고 하는 초 저가차를 인도 시장에 출시할 계획도 내놓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와 더불어 개발 도상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생존을 위한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내부적으로는 비용 저감을 통한 제품의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차 개발을 위한 R&D 비용부터 생산 비용 저감등 첩첩 사중이다. 또한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각국의 연비와 배기가스규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의 CAFE와 CO2 규정만으로도 엄청난데, ESP와 TPMS, 에어백 등의 의무화, 충돌 테스트 강화 등 안전성 강화에도 돈을 들여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재활용 비율의 상향 조정까지 맞춰야 할 규정들까지 끝이 없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1세기의 합종 연횡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여부의 핵심이다.
모터쇼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친환경차 대세’,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 경연의 장’. 마찬가지로 자동차회사들의 제휴관계나 인수합병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면 의례 ‘업계 재편성’이라는 제목이 등장한다. 이런 제목은 이제는 흔히 말하는 ‘낚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반복된다. 최근 다임러와 르노닛산이 제휴에 합의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합병을 통해 세력을 키우기 위한 것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2009년 폭스바겐이 스즈키를 합병하고 2010년 들어 르노닛산 연합과 다임러의 협력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그 종착점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지 않았다. 업체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1위 메이커로 부상을 노린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20세기에는 있었다. 글로벌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미국 메이커들이 자국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차회사들에게 ‘비용 저감(Cost Reduction)’은 숙명이 되었다. 그를 위해 부품회사를 옥죄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해 보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연간 100만대 이상은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1990년대 초 등장했다. 불과 몇 년 뒤 그것은 200만대 논리로 발전했고 1998년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세기의 합병은 400만대 논리의 결과로 정리됐다.
특히 서로 다른 세그먼트의 모델을 생산하는 메이커간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지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낳았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은 실패로 귀결됐다.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격차였고 두 번째는 문화적 괴리였다. 그것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경영하는 회사와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인 양산 메이커간의 어쩔 수 없는 갭이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르노닛산 연합과 GM의 제휴논의였다. 그 때는 1000만대 논리까지 발전했다. 결국은 무산됐지만 자동차회사들의 비용 저감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실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합집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칼 벤츠와 고트리프 다임러도 1926년 합병을 통해 다임러 벤츠가 됐다. 아우디도 네 개의 회사가 합해서 이루어진 회사다. 미국의 경우는 1920년대 300개가 넘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있었지만 1960년대 소위 말하는 빅3로 통합됐다.
이 후에도 규모의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 브랜드를 사들이거나 현지 생산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를 확장해 갔다. 미국 메이커들은 주로 회사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한 반면 토요타 등 일본 메이커들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 미쓰비시간의 제휴 실패로 다임러는 큰 손실을 입었고 크라이슬러와 미쓰비시 역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GM은 많은 브랜드들을 정리해 4개로 집중하겠다고 선언했고 포드는 재규어와 랜드로버, 볼보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최근에 그런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폭스바겐이다. 양산 브랜드인 세아트, 스코다를 비롯해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수퍼 럭셔리카 벤틀리, 람보르기니가 있고 여기에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일본 메이커 스즈키까지 끌어 들였다.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PSA푸조시트로엥과 한국의 현대기아 정도다. 르노와 닛산은 자본제휴관계로 완전 자회사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결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르노와 닛산의 CEO를 겸임하고 있는 브라질 태생 카를로스 곤의 행보는 GM과의 제휴논의 이후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초 다임러와의 전기차 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 상호 생산, 공동 구입,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한 기술의 공동 개발을 포함해 폭 넓은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용은 르노닛산은 다임러로부터 고급차용의 파워트레인을, 다임러는 르노닛산으로부터 소형차용 플랫폼의 공급을 받으면서 전기자동차 등의 개발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닛산은 인피니티 브랜드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현재 VQ 엔진은 오래돼어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다임러와의 제휴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닛산은 소형차용 플랫폼을 다임러에 제공하고 그 대신 7단 AT 등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에 대해 닛산 자동차의 엔지니어들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EV기술은 소형 시티 커뮤터로서 사용되든지 혹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프랑스처럼 화력이 아닌 원자력에 의한 전기 생산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이미 세느 강변에 전기차를 취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의 CIVITAS(City VIT Ality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유럽 교통 프로그램과 프랑스 국내 LOTI법(1982년에 인권과 사회정책을 중시한 국내 교통 기본법)에 따라 컴팩트한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 배경 때문에 르노닛산은 전기차 개발에 다른 메이커보다 열심인 것이다.
물론 전기차의 개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와 닛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닛산만의 독자적인 기술영역의 필요성이다. 가솔린 직분터보와 디젤은 유럽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와 혼다가 선점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 르노와 닛산의 존재감을 크게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후발 양산 업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하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인도의 마루티 스즈키가 생산하고 있는 A스타에 닛산의 엠블럼을 달고 픽소(Pixo)라는 이름으로 유럽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픽소는 도심형 시티카를 지향한다. 5도어 보디의 픽소는 전장×전폭×전고가 각각 3,565×1,470×1,600mm로 실내 공간을 극대화 한 것이 특징. 휠베이스도 2,360mm로 전장 대비 상당히 길다. 엔진은 3기통 1리터 가솔린이 올라간다. 픽소는 인도 델리에서 생산된다.
르노는 또 그룹 내에 다치아라는 저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다치아는 루마니아에 있는 르노 자회사로 로간이라는 차를 7,000유로라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저가차 공세에 폭스바겐도 브라질산 폭스로 대항하려 하고 있지만 유럽시장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스즈키는 르노닛산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폭스바겐을 위한 저가차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인도가 소형차 생산 거점으로 될 수도 있다.
폭스바겐과 르노닛산 외에 현대기아 등도 인도를 소형차 생산에 좋은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사업환경 차이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인도에서는 영어가 통한다.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역사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식도 중국보다는 크게 글로벌화되어 있다. 인도인들의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고 중국과 달리 창업도 자유롭다. 중국에서는 합작이 아니면 자동차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용 모델 이외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인도가 더 좋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을 간파한 카를로스 곤은 신형 닛산 마치를 태국과 멕시코뿐 아니라 인도에서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한 차체를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2012년까지 3,000 달러라고 하는 초 저가차를 인도 시장에 출시할 계획도 내놓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와 더불어 개발 도상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생존을 위한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이다. 내부적으로는 비용 저감을 통한 제품의 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차 개발을 위한 R&D 비용부터 생산 비용 저감등 첩첩 사중이다. 또한 갈수록 강화되어 가는 각국의 연비와 배기가스규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의 CAFE와 CO2 규정만으로도 엄청난데, ESP와 TPMS, 에어백 등의 의무화, 충돌 테스트 강화 등 안전성 강화에도 돈을 들여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재활용 비율의 상향 조정까지 맞춰야 할 규정들까지 끝이 없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21세기의 합종 연횡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여부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