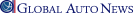글로벌자동차산업,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11-11-01 06:08:24 |
본문
글로벌자동차산업, 파트너십이 핵심이다.
최근 자동차업계 일각에서 또 이른 바 ‘살아 남을 메이커 톱×’론이 나오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이 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눈길 끄는 제목을 좋아 하는 미디어들의 취향을 고려한 자극적인 주제다. 20세기 말에는 톱10이었다가 21세기 초에는 톱6로, 그리고 지금은 톱3로 변했다. 하지만 문제는 살아 남을 메이커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이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빅3론이다. 폭스바겐과 현대기아, 토요타, 또는 폭스바겐과 현대기아, GM 등 세 개 메이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예외로 한다. 양산 메이커들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다분히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의 입장에서 듣기 좋아 보인다.
그 배경에는 2009년 파산보호 신청 단계까지 갔던 GM이나 그 해부터 부각된 리콜 사태 이후로 동일본 지진까지 겹쳐 곤궁에 처한 토요타가 있다. 분명 두 메이커는 ‘애매한’ 처지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흥미를 끌기 위한 주제이다. 오늘날은 그런 주제 보다 제휴와 파트너십이 포인트다. 파트너십은 메이커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니치 브랜드들의 이동으로 업계 지도는 달라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별다른 파트너십 없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메이커는 GM과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 포드, 현대기아 등이다. 여기에 르노닛산과 PSA푸조 시트로엥, 혼다, 파이트 그룹까지 포함하면 9개 메이커가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 그룹과 다임러 AG까지 더하면 11개 메이커나 된다. 과거의 빅10론이나 빅6론이 무의미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이들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 공유와 기술 교류 관계로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비용 저감을 위한 측면에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 사이에서도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다. BMW와 PSA푸조의 제휴가 좋은 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다.
현 시점에서 독자 생존을 위한 규모의 한계는 연간 생산 5백만 대 정도로 보고 있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했을 당시에는 400만대였으나 가격 압박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는 1,000만대 시대를 거론했던 GM과 르노닛산의 합병제휴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됐었다. 무엇보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의 결별로 인해 규모의 경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등장했다. 물론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두 건의 제휴가 주목을 끌고 있다. 폭스바겐과 스즈키, 다임러AG와 르노닛산이 그것이다.
스즈키는 2009년 프랑크푸르트오토쇼 전날 개최된 폭스바겐 그룹데이 이벤트에 폭스바겐 패밀리로 소개됐었다. 스즈키의 회장이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스즈키는 오랫동안 GM의 자회사였다. 그러나 2011년의 같은 행사장에는 스즈키 브랜드가 없었다. 쇼 직전의 뉴스를 통해 스즈키가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두 메이커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스즈키는 GM의 자회사였으나 기술적으로는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직기회사로 출발해 오토바이에 이어 4륜차에까지 발전한 스즈키는 일본 경차의 시조 메이커이다. 스즈라이트라는 경차는 일본에서 국민차로 여겨졌으며 알토라는 차는 대우자동차가 티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도에서 마루티스즈키라는 회사를 통해 인도의 국민차를 생산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브랜드명 그대로 ‘만인이 원하는 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양산 브랜드로 규모면에서 스즈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스즈키를 편입시켜 규모의 경제효과를 노리고자 했다. 하지만 스즈키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다. 자본 제휴를 하더라도 종속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이다. 문화가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다임러 AG와 르노닛산의 제휴.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은 그룹 회생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GM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간(정확히는 세 회사)의 제휴내용은 다임러의 스마트 플랫폼을 르노닛산에 제공하는 것과 스마트 플랫폼은 미쓰비시의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미쓰비시와의 제휴관계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르노닛산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임러는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에게 V6 가솔린 엔진과 2.2리터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그리고 컴팩트카 플랫폼을 공급한다. 렉서스와 경쟁하려는 인피니티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닛산은 메르세데스 벤츠 B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 렉서스 CT200h와 경쟁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도 일본이 아닌 유럽으로 예정하고 있어 엔고와 관세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엔진등에 대해서도 폭 넓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르노닛산이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다임러 AG입장에서도 이산화탄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소형차를 판매해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에서 소형차의 판매 증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희소성이라는 가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BMW와 PSA푸조시트로엥간의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이라든가 BMW와 폭스바겐 간의 SGL 카본 지분 확대, GM과 SAIC, 폭스바겐과 SAIC이 각각 전기차를 합작 개발하기로 한 것 등도 파트너십 확대의 좋은 예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비용 저감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은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인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 자동차업계 일각에서 또 이른 바 ‘살아 남을 메이커 톱×’론이 나오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이 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눈길 끄는 제목을 좋아 하는 미디어들의 취향을 고려한 자극적인 주제다. 20세기 말에는 톱10이었다가 21세기 초에는 톱6로, 그리고 지금은 톱3로 변했다. 하지만 문제는 살아 남을 메이커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건이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빅3론이다. 폭스바겐과 현대기아, 토요타, 또는 폭스바겐과 현대기아, GM 등 세 개 메이커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예외로 한다. 양산 메이커들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다분히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의 입장에서 듣기 좋아 보인다.
그 배경에는 2009년 파산보호 신청 단계까지 갔던 GM이나 그 해부터 부각된 리콜 사태 이후로 동일본 지진까지 겹쳐 곤궁에 처한 토요타가 있다. 분명 두 메이커는 ‘애매한’ 처지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흥미를 끌기 위한 주제이다. 오늘날은 그런 주제 보다 제휴와 파트너십이 포인트다. 파트너십은 메이커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니치 브랜드들의 이동으로 업계 지도는 달라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별다른 파트너십 없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메이커는 GM과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 포드, 현대기아 등이다. 여기에 르노닛산과 PSA푸조 시트로엥, 혼다, 파이트 그룹까지 포함하면 9개 메이커가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 그룹과 다임러 AG까지 더하면 11개 메이커나 된다. 과거의 빅10론이나 빅6론이 무의미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이들간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 공유와 기술 교류 관계로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비용 저감을 위한 측면에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 사이에서도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다. BMW와 PSA푸조의 제휴가 좋은 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다.
현 시점에서 독자 생존을 위한 규모의 한계는 연간 생산 5백만 대 정도로 보고 있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했을 당시에는 400만대였으나 가격 압박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는 1,000만대 시대를 거론했던 GM과 르노닛산의 합병제휴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됐었다. 무엇보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의 결별로 인해 규모의 경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등장했다. 물론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두 건의 제휴가 주목을 끌고 있다. 폭스바겐과 스즈키, 다임러AG와 르노닛산이 그것이다.
스즈키는 2009년 프랑크푸르트오토쇼 전날 개최된 폭스바겐 그룹데이 이벤트에 폭스바겐 패밀리로 소개됐었다. 스즈키의 회장이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스즈키는 오랫동안 GM의 자회사였다. 그러나 2011년의 같은 행사장에는 스즈키 브랜드가 없었다. 쇼 직전의 뉴스를 통해 스즈키가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두 메이커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스즈키는 GM의 자회사였으나 기술적으로는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직기회사로 출발해 오토바이에 이어 4륜차에까지 발전한 스즈키는 일본 경차의 시조 메이커이다. 스즈라이트라는 경차는 일본에서 국민차로 여겨졌으며 알토라는 차는 대우자동차가 티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기도 했다. 지금은 인도에서 마루티스즈키라는 회사를 통해 인도의 국민차를 생산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브랜드명 그대로 ‘만인이 원하는 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양산 브랜드로 규모면에서 스즈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스즈키를 편입시켜 규모의 경제효과를 노리고자 했다. 하지만 스즈키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다. 자본 제휴를 하더라도 종속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이다. 문화가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다임러 AG와 르노닛산의 제휴.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은 그룹 회생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GM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간(정확히는 세 회사)의 제휴내용은 다임러의 스마트 플랫폼을 르노닛산에 제공하는 것과 스마트 플랫폼은 미쓰비시의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미쓰비시와의 제휴관계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르노닛산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임러는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에게 V6 가솔린 엔진과 2.2리터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그리고 컴팩트카 플랫폼을 공급한다. 렉서스와 경쟁하려는 인피니티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닛산은 메르세데스 벤츠 B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 렉서스 CT200h와 경쟁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도 일본이 아닌 유럽으로 예정하고 있어 엔고와 관세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회사는 엔진등에 대해서도 폭 넓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르노닛산이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다임러 AG입장에서도 이산화탄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소형차를 판매해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에서 소형차의 판매 증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희소성이라는 가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BMW와 PSA푸조시트로엥간의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이라든가 BMW와 폭스바겐 간의 SGL 카본 지분 확대, GM과 SAIC, 폭스바겐과 SAIC이 각각 전기차를 합작 개발하기로 한 것 등도 파트너십 확대의 좋은 예다.
연비와 이산화탄소, 비용 저감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은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인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