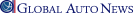현대 벨로스터 터보, 무엇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12-07-25 22:43:16 |
본문
프리미엄 브랜드는 고성능 디비전을 아예 서브 브랜드로 해서 육성한다. BMW M을 비롯해 아우디 S/RS, 메르세데스 벤츠 AMG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서브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높은 수익성으로 메이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AMG 디비전을 통해 F1 팀을 지원하고 F1 머신용 고성능 엔진을 별도로 개발 생산한다. 크게 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고성능 디비전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니치 브랜드와 양산 브랜드들은 브랜드 내에 고성능 모델들을 라인업하고 있다. 니치 브랜드인 재규어는 베이스 모델에 R라인을, 볼보도 R 버전을 추가하고 있다. 양산 브랜드인 폭스바겐은 잠깐 단종한 적이 있었지만 GTi를 세대를 거듭하며 키워 오고 있다. 골프라는 '만인을 위한 모델'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GTi의 주행성으로 인한 것이다.
골프를 벤치마킹해 패밀리 세단을 만들었던 토요타도 그런 전략에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MR-S라는 스페셜카로 스포티한 성능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고 단종했다. 대신 이번에 다시 하치로크(86)로 부활했다. 하치로크는 스바루의 BRZ와 공동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일본 메이커 중에서는 토요타보다는 혼다와 닛산이 스페셜 모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닛산은 Z시리즈를 변함없이 육성하고 있다. 페어래디 Z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말에 등장해 지금은 370Z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다. 370Z는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인 인피니티의 G시리즈로 BMW를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표방하며 닛산의 이미지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GT-R이라는 고성능 모델로는 닛산의 성능을 표현하고 있다.
혼다도 닛산 못지 않게 스포츠카의 이미지가 강하다. 혼다는 NSX라는 이탈리안 이그조틱카를 벤치마킹한 모델을 만들 정도로 스포츠카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 하지만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없는 짧은 역사로 그다지 빛을 보이 못했다. 그러나 S2000이라는 경량 로드스터는 혼다의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K로 시작된 2인승 경량 로드스터의 바람은 BMW Z3/Z4, 포르쉐 박스터, 아우디 TT 등을 이끌어 냈다. 양산 브랜드가 만든 이 장르의 모델로서 이들 독일 메이커들과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모델은 혼다 S2000이 대표적이었다. 지금은 CR-Z라는 모델로 성격이 약간 바뀌었고 대신 NSX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
'달리고 돌고 멈춘다.'고 하는 자동차의 본질에 더해 감동(Emotion)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해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모델들은 언제나 로망이다. 자동차회사들은 그런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고성능 디비전을 만들고 스포츠 버전의 모델을 만든다.
현대자동차도 이 분야에서 역사는 짧지 않다. 1990년 스쿠프라는 모델이 시작이다. 이어서 티뷰론, 투스카니로 명맥을 이어왔고 이제 그 역할을 성능의 표현은 제네시스 쿠페가 스타일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 리더로서의 역할은 벨로스터가 계승했다.
참고로 '스포츠 패션카'라는 이름으로 1990년 등장했던 스쿠프는 내수 6만 3,294대, 수출 17만 8,693대로 모두 24만 1,987대가 팔렸다. 이어서 등장한 티뷰론은 내수 3만 4,056대, 수출 22만 5,768대로 합계 25만 9,824대, 투스카니는 내수 2만 6,261대, 수출 27만 509대로 모두 29만 6,770대로 변화하면서 판매대수도 증가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쿠페는 내수 1만 3,970대, 수출 7만 1,256대로 합계 8만 5,235대, 벨로스터는 1만 3,060대, 수출 7만 3,754대로 모두 8만 6,814대가 각각 팔렸다.
현대자동차도 이제는 성능을 표현하는 모델과 스페셜카를 각각 라인업하고 있다. 다만 벨로스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제네시스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소형 경량 스포츠카로서의 성격을 부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 2011년 디트로이트오토쇼장에서 벨로스터를 처음 보았을 때 폭발적인 반응에 놀랐다. 그런 관심을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어떤 성격의 모델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파워트레인을 동급 모델에 올라 가는 1.6GDi를 탑재해 좀 더 강한 그 무엇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아쉬움을 주었다.
다른 패밀리카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모델을 먼저 내 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파생 모델을 출시하는 전형적인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1.6GDi 터보차저 버전과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조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각적인 아이덴티티에 더해 체감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의견이다.
자동차가 주는 감동은 디자인으로 시각을, 사운드로 청각을, 하체 성능으로 본능을 자극한다. 유럽 메이커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저들을 길들여 왔고 여전히 그런 논리는 통하고 있다. 친환경차를 만들면서도 그들의 DNA를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벨로스터는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르의 개척이 포인트다. 하체 특성도 유럽차를 의식한 세팅을 하고 있다. 상당한 발전이다. 하지만 제네시스 쿠페에서 지적했듯이 하체 전자제어 장비들이 톱합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패밀리카를 기준으로 한다면 넘치는 성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스포츠 주행성을 주장하려면 잠재력이 중요한 요소다. 차체가 큰 제네시스 쿠페보다는 벨로스터에서 더 소화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니치 브랜드와 양산 브랜드들은 브랜드 내에 고성능 모델들을 라인업하고 있다. 니치 브랜드인 재규어는 베이스 모델에 R라인을, 볼보도 R 버전을 추가하고 있다. 양산 브랜드인 폭스바겐은 잠깐 단종한 적이 있었지만 GTi를 세대를 거듭하며 키워 오고 있다. 골프라는 '만인을 위한 모델'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GTi의 주행성으로 인한 것이다.
골프를 벤치마킹해 패밀리 세단을 만들었던 토요타도 그런 전략에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MR-S라는 스페셜카로 스포티한 성능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고 단종했다. 대신 이번에 다시 하치로크(86)로 부활했다. 하치로크는 스바루의 BRZ와 공동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과거와는 다르다.
일본 메이커 중에서는 토요타보다는 혼다와 닛산이 스페셜 모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닛산은 Z시리즈를 변함없이 육성하고 있다. 페어래디 Z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말에 등장해 지금은 370Z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다. 370Z는 닛산의 럭셔리 브랜드인 인피니티의 G시리즈로 BMW를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표방하며 닛산의 이미지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GT-R이라는 고성능 모델로는 닛산의 성능을 표현하고 있다.
혼다도 닛산 못지 않게 스포츠카의 이미지가 강하다. 혼다는 NSX라는 이탈리안 이그조틱카를 벤치마킹한 모델을 만들 정도로 스포츠카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 하지만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없는 짧은 역사로 그다지 빛을 보이 못했다. 그러나 S2000이라는 경량 로드스터는 혼다의 기술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메르세데스 벤츠 SLK로 시작된 2인승 경량 로드스터의 바람은 BMW Z3/Z4, 포르쉐 박스터, 아우디 TT 등을 이끌어 냈다. 양산 브랜드가 만든 이 장르의 모델로서 이들 독일 메이커들과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모델은 혼다 S2000이 대표적이었다. 지금은 CR-Z라는 모델로 성격이 약간 바뀌었고 대신 NSX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

'달리고 돌고 멈춘다.'고 하는 자동차의 본질에 더해 감동(Emotion)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해 '달리기'에 초점을 맞춘 모델들은 언제나 로망이다. 자동차회사들은 그런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고성능 디비전을 만들고 스포츠 버전의 모델을 만든다.
현대자동차도 이 분야에서 역사는 짧지 않다. 1990년 스쿠프라는 모델이 시작이다. 이어서 티뷰론, 투스카니로 명맥을 이어왔고 이제 그 역할을 성능의 표현은 제네시스 쿠페가 스타일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 리더로서의 역할은 벨로스터가 계승했다.
참고로 '스포츠 패션카'라는 이름으로 1990년 등장했던 스쿠프는 내수 6만 3,294대, 수출 17만 8,693대로 모두 24만 1,987대가 팔렸다. 이어서 등장한 티뷰론은 내수 3만 4,056대, 수출 22만 5,768대로 합계 25만 9,824대, 투스카니는 내수 2만 6,261대, 수출 27만 509대로 모두 29만 6,770대로 변화하면서 판매대수도 증가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쿠페는 내수 1만 3,970대, 수출 7만 1,256대로 합계 8만 5,235대, 벨로스터는 1만 3,060대, 수출 7만 3,754대로 모두 8만 6,814대가 각각 팔렸다.
현대자동차도 이제는 성능을 표현하는 모델과 스페셜카를 각각 라인업하고 있다. 다만 벨로스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제네시스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소형 경량 스포츠카로서의 성격을 부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 2011년 디트로이트오토쇼장에서 벨로스터를 처음 보았을 때 폭발적인 반응에 놀랐다. 그런 관심을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어떤 성격의 모델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그러나 파워트레인을 동급 모델에 올라 가는 1.6GDi를 탑재해 좀 더 강한 그 무엇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아쉬움을 주었다.
다른 패밀리카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모델을 먼저 내 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파생 모델을 출시하는 전형적인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1.6GDi 터보차저 버전과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조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각적인 아이덴티티에 더해 체감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의견이다.
자동차가 주는 감동은 디자인으로 시각을, 사운드로 청각을, 하체 성능으로 본능을 자극한다. 유럽 메이커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저들을 길들여 왔고 여전히 그런 논리는 통하고 있다. 친환경차를 만들면서도 그들의 DNA를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벨로스터는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르의 개척이 포인트다. 하체 특성도 유럽차를 의식한 세팅을 하고 있다. 상당한 발전이다. 하지만 제네시스 쿠페에서 지적했듯이 하체 전자제어 장비들이 톱합적으로 제어하는 데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패밀리카를 기준으로 한다면 넘치는 성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스포츠 주행성을 주장하려면 잠재력이 중요한 요소다. 차체가 큰 제네시스 쿠페보다는 벨로스터에서 더 소화하기 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