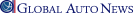한국차 브랜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05-11-09 05:58:24 |
본문
한국차 브랜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룬만큼 우여곡절도 많았고 쓰라는 실패도 경험한 것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울 당시 아무도 자체 모델을 개발해 낼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으나 한국인들은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물론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데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초기 규모에 비해 많은 메이커가 난립해 자동차산업합리화 조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진통을 거듭했다. 거화라든가 새한이라든가 하는 지금은 생소한 이름으로 사라진 브랜드들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자동차가 사라졌고 대우자동차도 이제는 점차 브랜드로서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차의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해외로 수출을 했던 것들, 또는 지금도 내수는 물론 수출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새한자동차가 전신인 대우자동차는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할 것 같았지만 한국식 재벌의 병폐와 맞물려 자체 브랜드로의 세 확장은 당장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GM이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이 만든 모델을 다른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품성이 좋아 불과 수년 사이에 생산량이 세 배 이상 증가했고 2005년의 예상 실적으로는 지주회사인 GM그룹 전체 판매의 15%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을 해 가고 있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그리고 SUV 전문 메이커를 표방해 온 쌍용자동차도 이제는 중국 상해기차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다만 상해기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 당장에는 쌍용자동차라는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대우자동차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쌍용자동차 규모로는 자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황의 전개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역시 한국식 상황에서 90년대 말 등장했다가 르노그룹 산하로 들어간 르노삼성은 위의 두 회사와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르노라는 역사 깊은 유럽 브랜드와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삼성을 합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당장에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세 메이커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체적으로 브랜드 전략을 추구해 그것을 확장해 갈 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차의 브랜드”라는 타이틀로 이야기한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병은 오늘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자동차산업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90년대 말 IMF를 겪으면서 격동의 세월 속에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두 회사가 합병을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 자국 자본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메이커의 존재를 가능케 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연구개발시설을 통합했고 각 모델들의 플랫폼 통합을 통해 엄청난 비용 저감 효과를 이루어 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소위 말하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이란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EF쏘나타의 플랫폼 하나로 기아 옵티마와 싼타페, 트라제, 그랜저XG 등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양산차 메이커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16가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도 합병 이후 플랫폼 통합 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는 완성단계에 와있다.
현대와 기아처럼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규모를 이루는 예는 세계적으로도 많다. 1976년 합병한 프랑스의 푸조와 시트로엥을 비롯해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1990년대 말 합병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크라이슬러도 여기에 속한다. 합병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제휴 형태로 자본을 수혈받은 르노닛산 그룹 등 토요타와 혼다 등 두 메이커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10개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 대부분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자동차회사들은 동시에 브랜드 경영을 하고 있다. 브랜드 경영은 한마디로 하자면 제 값을 받고 팔자는 것이다. 똑 같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더라도 백화점에 전시될 수 있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하는 브랜드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자동차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시장 메인스트림들의 구매 대상 리스트에 올리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공산품이 그렇듯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차 시장에서 나름대로 시장 확대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좀 더 수준 높은 제품으로 수준 높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현대가 아닌 별도의 브랜드로 한다는 원칙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월간 모터트렌드 05/11월호 게재 원고)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룬만큼 우여곡절도 많았고 쓰라는 실패도 경험한 것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울 당시 아무도 자체 모델을 개발해 낼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으나 한국인들은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물론 국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데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초기 규모에 비해 많은 메이커가 난립해 자동차산업합리화 조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진통을 거듭했다. 거화라든가 새한이라든가 하는 지금은 생소한 이름으로 사라진 브랜드들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자동차가 사라졌고 대우자동차도 이제는 점차 브랜드로서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차의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해외로 수출을 했던 것들, 또는 지금도 내수는 물론 수출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새한자동차가 전신인 대우자동차는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할 것 같았지만 한국식 재벌의 병폐와 맞물려 자체 브랜드로의 세 확장은 당장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GM이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이 만든 모델을 다른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품성이 좋아 불과 수년 사이에 생산량이 세 배 이상 증가했고 2005년의 예상 실적으로는 지주회사인 GM그룹 전체 판매의 15%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을 해 가고 있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그리고 SUV 전문 메이커를 표방해 온 쌍용자동차도 이제는 중국 상해기차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다만 상해기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 당장에는 쌍용자동차라는 브랜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대우자동차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쌍용자동차 규모로는 자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황의 전개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
그리고 역시 한국식 상황에서 90년대 말 등장했다가 르노그룹 산하로 들어간 르노삼성은 위의 두 회사와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르노라는 역사 깊은 유럽 브랜드와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삼성을 합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당장에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세 메이커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체적으로 브랜드 전략을 추구해 그것을 확장해 갈 수는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차의 브랜드”라는 타이틀로 이야기한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병은 오늘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자동차산업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90년대 말 IMF를 겪으면서 격동의 세월 속에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두 회사가 합병을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 자국 자본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메이커의 존재를 가능케 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연구개발시설을 통합했고 각 모델들의 플랫폼 통합을 통해 엄청난 비용 저감 효과를 이루어 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소위 말하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이란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EF쏘나타의 플랫폼 하나로 기아 옵티마와 싼타페, 트라제, 그랜저XG 등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양산차 메이커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16가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도 합병 이후 플랫폼 통합 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는 완성단계에 와있다.
현대와 기아처럼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규모를 이루는 예는 세계적으로도 많다. 1976년 합병한 프랑스의 푸조와 시트로엥을 비롯해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1990년대 말 합병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크라이슬러도 여기에 속한다. 합병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제휴 형태로 자본을 수혈받은 르노닛산 그룹 등 토요타와 혼다 등 두 메이커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10개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 대부분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의 모든 자동차회사들은 동시에 브랜드 경영을 하고 있다. 브랜드 경영은 한마디로 하자면 제 값을 받고 팔자는 것이다. 똑 같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더라도 백화점에 전시될 수 있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하는 브랜드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자동차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시장 메인스트림들의 구매 대상 리스트에 올리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모든 공산품이 그렇듯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차 시장에서 나름대로 시장 확대에 성공한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좀 더 수준 높은 제품으로 수준 높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현대가 아닌 별도의 브랜드로 한다는 원칙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월간 모터트렌드 05/11월호 게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