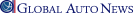현대기아차가 사는 법-2.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1)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07-06-15 06:45:49 |
본문
현대기아차가 사는 법-2.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미국 크라이슬러의 주식 80.1%를 미국의 사모펀드 서베러스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같은 독일의 BMW가 1994년 영국의 로버를 인수했다가 2000년에 단 돈 10파운드에 매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대로다. 자동차업계에서의 인수합병이야 유사 이래 수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를 지켜 보는 세간의 반응은 항상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1990년대 초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을 때 BMW의 베른트 피세츠리더와 볼프강 라이츨레는 그동안 혼다로부터 기술력을 제공받아 영국 버전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3월 18일의 일이었다.
연간 100만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처음부터 파국의 씨를 안고 있었다. 우선은 로버 내부에서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룩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단지 혼다나 BMW로 인수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세울 수 있을만큼 독일 메이커는 영국 메이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로버의 전통적인 구조를 독일의 형태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 역시 너무 늦게 확정되었다. 실행력이 없었다는 얘기이다.
결국 로버는 1997년 2억 6,000만 마르크의 적자가 1년만에 18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다. 그렇다고 그런 손실을 본 만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BMW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쏜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고 이 일을 추진했던 베른트 피셰츠리더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받은 신임 회장 오아힘 밀베르그(Joachim Milberg)에 의해 2000년 5월 로버는 10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피닉스컨소시엄에게 매각되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이 진행되던 시기 독일의 다임러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세기의 합병’을 발표하며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다임러 벤츠의 위르겐 슈렘프회장과 크라이슬러 밥 이튼 사이에 이루어진 극비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자동차업계는 또 한번 격동의 세월을 맞게 된다. BMW와 로버의 합병 당시와 다른 점이라면 100만대의 규모가 400만대로 확대됐다는 것 정도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이 두 회사 역시 태생부터 차이점을 보였고 톱 경영진들의 의사와는 달리 양 진영의 종사자들은 근본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는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 대목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와 다른 세그먼트의 통합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며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즉 고급차 중심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양산차 중심의 크라이슬러의 결합은 환상적이라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21세기에는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얘기이다.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가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한 것은 1998년 5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르노와 닛산이 자본제휴를 발표해 세계 자동차산업이 6대 그룹과 혼다, BMW등 자국 자본에 의한 회사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세가 갖추어졌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5년여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동차산업은 탄생 이래 합병과 통합의 역사를 계속해 왔다.
합병과 통합이 처음으로 극성을 부렸던 것은 1920년대와 30년대로 각 나라의 국내 기업들이 서로 뭉치는 형태로 일어났다. 그래서 무려 320개가 넘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있었던 미국이 오늘날의 빅3로 규모화를 추구한 것도 끝없는 합병과 통합의 결과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60년대에 통합을 완료했고 7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후 국제적인 통합과 제휴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미국의 GM과 일본의 토요타가 절반씩 투자해 1982년 미국에 NUMMI를 설립해 생산을 개시한 것이 그 시초다. 이것이 국제적 규모의 합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제적인 업계 재편은 가속화되어갔는데 그 이유는 물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생산설비의 건설과 제품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부품을 공유화하면 개발비를 저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각기 다른 브랜드로 판매해 라이벌들과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EF 쏘나타와 옵티마의 플랫폼이 같은 모델이면서도 가격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만든다면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의 예를 보자면 폭스바겐 골프와 아우디 A4, 토요타 매트릭스와 폰티악 바이브(정확히는 OEM이지만), 홀덴의 모나로와 폰티악 G6, 사브 9-3와 오펠 벡트라 등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어쨌거나 20세기 말 세계의 자동차업계는 그런 수익성 찾기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를 부르짖으며 합병과 제휴를 절체절명의 요건으로 여겼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대로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바겐 그룹, 르노닛산 그룹, 피아트 그룹, 토요타 그룹 등 대규모 그룹과 BMW, PSA푸조, 혼다. 현대기아차그룹등 10개 정도의 그룹으로 재편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다시 크라이슬러가 다임러벤츠와 결별하면서 양상은 새롭게 전개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 니치 브랜드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자동차산업이 규모의 경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규모 확보를 위한 합병을 했다면 그를 통해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미국 크라이슬러의 주식 80.1%를 미국의 사모펀드 서베러스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같은 독일의 BMW가 1994년 영국의 로버를 인수했다가 2000년에 단 돈 10파운드에 매각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대로다. 자동차업계에서의 인수합병이야 유사 이래 수없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를 지켜 보는 세간의 반응은 항상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1990년대 초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을 때 BMW의 베른트 피세츠리더와 볼프강 라이츨레는 그동안 혼다로부터 기술력을 제공받아 영국 버전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3월 18일의 일이었다.
연간 100만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처음부터 파국의 씨를 안고 있었다. 우선은 로버 내부에서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룩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단지 혼다나 BMW로 인수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세울 수 있을만큼 독일 메이커는 영국 메이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로버의 전통적인 구조를 독일의 형태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 역시 너무 늦게 확정되었다. 실행력이 없었다는 얘기이다.
결국 로버는 1997년 2억 6,000만 마르크의 적자가 1년만에 18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다. 그렇다고 그런 손실을 본 만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BMW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쏜을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고 이 일을 추진했던 베른트 피셰츠리더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받은 신임 회장 오아힘 밀베르그(Joachim Milberg)에 의해 2000년 5월 로버는 10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피닉스컨소시엄에게 매각되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이 진행되던 시기 독일의 다임러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세기의 합병’을 발표하며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다. 다임러 벤츠의 위르겐 슈렘프회장과 크라이슬러 밥 이튼 사이에 이루어진 극비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자동차업계는 또 한번 격동의 세월을 맞게 된다. BMW와 로버의 합병 당시와 다른 점이라면 100만대의 규모가 400만대로 확대됐다는 것 정도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듯이 두 회사 역시 태생부터 차이점을 보였고 톱 경영진들의 의사와는 달리 양 진영의 종사자들은 근본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는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 대목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와 다른 세그먼트의 통합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며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즉 고급차 중심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양산차 중심의 크라이슬러의 결합은 환상적이라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21세기에는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얘기이다.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가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한 것은 1998년 5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르노와 닛산이 자본제휴를 발표해 세계 자동차산업이 6대 그룹과 혼다, BMW등 자국 자본에 의한 회사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세가 갖추어졌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5년여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동차산업은 탄생 이래 합병과 통합의 역사를 계속해 왔다.
합병과 통합이 처음으로 극성을 부렸던 것은 1920년대와 30년대로 각 나라의 국내 기업들이 서로 뭉치는 형태로 일어났다. 그래서 무려 320개가 넘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있었던 미국이 오늘날의 빅3로 규모화를 추구한 것도 끝없는 합병과 통합의 결과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60년대에 통합을 완료했고 7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후 국제적인 통합과 제휴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미국의 GM과 일본의 토요타가 절반씩 투자해 1982년 미국에 NUMMI를 설립해 생산을 개시한 것이 그 시초다. 이것이 국제적 규모의 합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국제적인 업계 재편은 가속화되어갔는데 그 이유는 물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생산설비의 건설과 제품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부품을 공유화하면 개발비를 저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각기 다른 브랜드로 판매해 라이벌들과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EF 쏘나타와 옵티마의 플랫폼이 같은 모델이면서도 가격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만든다면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의 예를 보자면 폭스바겐 골프와 아우디 A4, 토요타 매트릭스와 폰티악 바이브(정확히는 OEM이지만), 홀덴의 모나로와 폰티악 G6, 사브 9-3와 오펠 벡트라 등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어쨌거나 20세기 말 세계의 자동차업계는 그런 수익성 찾기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를 부르짖으며 합병과 제휴를 절체절명의 요건으로 여겼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대로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폭스바겐 그룹, 르노닛산 그룹, 피아트 그룹, 토요타 그룹 등 대규모 그룹과 BMW, PSA푸조, 혼다. 현대기아차그룹등 10개 정도의 그룹으로 재편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다시 크라이슬러가 다임러벤츠와 결별하면서 양상은 새롭게 전개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 니치 브랜드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자동차산업이 규모의 경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규모 확보를 위한 합병을 했다면 그를 통해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