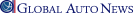한국판 왕눈이 T-600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09-06-04 17:18:28 |
본문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자동차 모델들은 놀랍게도 서로 같은 모양이 없다. 이 말은 한 메이커에서 만들어진 같은 모델은 있지만, 메이커와 차종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모양의 차가 없다는 의미이다. 마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두 개의 눈과 귀, 한 개의 코와 입을 가졌지만, 똑같은 얼굴의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똑같지만 다르다는 것은 일견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혹자는 만약 지구의 모든 남자들이 영화배우 아놀×슈왈×x네거처럼 건장하고, 모든 여자들은 여배우 캐×린 제타 ×스처럼 매력적이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거리가 온통 모두 똑같은 아놀× 와 캐×린 같은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결국 바닷가의 모래와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만약 그 모래알 중 둥글지 않고 네모난 모래알이 하나 있다면, 그는 모래알 세계의 아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세계에는 무척이나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한편으로 일명 '왕눈이'라는 별명으로 구분될 법한 얼굴을 가진 차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왕눈이들도 결코 같지 않다. 이미 이 코너의 초반에 다루었던 오스틴 힐리나 메셔슈미트 같은 귀여운 얼굴의 왕눈이에서부터 시작해 포르쉐와 같은 서늘한 이미지의 고성능 왕눈이까지, 모두가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를 가졌지만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포르쉐는 둥근 헤드램프를 가진 911 시리즈 이외에도 1980년대에는 둥근 헤드램프가 강조되지 않는 스타일을 가진 924, 928, 944 등의 모델들을 발표했지만,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 90년대에 시작된 박스터 시리즈를 비롯한 신형 모델들이 거의 모두 둥근 헤드램프를 가진 귀여운(?) 911 모델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단지 크고 둥그런 헤드램프를 가진 '왕눈이스러운' 차들 또한 적지 않은데, 이처럼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가 많았던 것은 스타일 적인 이유보다는 빛을 반사하고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사경과 렌즈의 제작 시 원형의 형태가 가장 만들기 쉬운 형태라는 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 와서 매우 다양해진 모양의 램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 기본구조의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 원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왕눈이 자동차들의 특징에서 공통적인 것은 앞모습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의 비중이 적거나 또는 그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4각형 헤드램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헤드램프는 원형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큰 차에서는 '왕눈이'의 인상은 들지 않는다. 앞서의 몇 차종들은 모두가 앞모습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동그란 헤드램프만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빛내고 있을 따름이다.
기아산업의 3륜차 생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차들 중에 왕눈이는 몇 가지나 될까? 사실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를 쓴 것으로 따지자면 옛날은 물론 지금도 승용차와 트럭에서 그 종류는 꽤 될 것이지만, 그들 모두가 왕눈이인 것은 아니다. '왕눈이'라는 소릴 들으려면 적어도(마치 요즘의 어느 개그맨의 말투 같기도 하다)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 형태가 차체의 형태에 묻히지 않고 그야말로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왕눈이의 자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우리 나라 왕눈이에는 기아 마스터 T-600이 있다. T-600이라는 차 이름으로만 본다면 마치 영화 속의 터×네이터 이름처럼 보이기도 해 생소하지만, 이 차는 1969년부터 기아산업에서 만들어진 3륜 소형 화물차(보통 용달차〈用達車〉라고 했었다)이다.
지금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회사가 된 기아자동차는 1990년까지는 기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다. 기아산업의 모태가 된 경성정공은 1944년에 설립되었고, 6.25사변을 겪는 동안 '3000리호'로 대표되는 자전거를 만들면서 회사 이름을 기아산업으로 바꾸게 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성정공의 창업자인 김철호 사장은 회사 이름을 바꿀 때, 기아(起亞)의 의미로 아시아(亞)를 일으킨다(起)는 뜻과 아울러, 기계부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어(gear)의 일본식 발음 기아(キア)에서도 힌트를 얻었다고도 한다.
기아산업은 3000리호 자전거 생산에 이어 2륜차(오토바이)를 일본의 혼다와 기술 제휴하여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1962년에는 화물차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동양공업과 제휴하였다. 동양공업은 지금은 포드에 인수된 일본 메이커 마쯔다(Mazda)의 본래 이름인데, 마쯔다 라는 이름을 동양공업이라는 이름과 혼용하다가 1980년대 초 이들이 소형 승용차 수출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마쯔다(Mazda)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62년에 기아산업과 제휴하면서도 마쯔다라는 이름을 썼으나, 이 때에는 영어로 마스터(Master)라고 음역해서 쓰게 되었다. 물론 이들이 마쯔다를 마스터로 음역한 것이 자신들이 기아산업에게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주는 주인(master)이라는 오만한(?)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 아니 상당 기간동안 기아산업의 차량에는 기아마스터(KIAMASTER)라는 긴 이름이 붙여졌었다.
기아산업은 1962년 1월에 K-360이라는 소형 3륜차를 내놓았다. 총 배기량 356cc의 경3륜차인 K-360은 1961년 12월에 시작품 8대를 제작하는데 성공하고 1962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요가 부진하여 첫 해에 67대, 다음 해인 1963년에 75대, 1964년에 23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어 1963년 3월에는 두 번째 3륜차 T-1500을 내놓았지만, 역시 판매가 부진하여 첫 해에 116대, 다음 해인 1964년에 겨우 10대가 팔렸다. 이들 차종의 판매가 부진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역시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기아산업은 1966년이 되자 마쯔다의 여러 차종을 분석한 끝에 다시 중형급 T-2000과 소형 T-600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여 마침내 T-600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1967년 T-2000이 발매되자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고, 뒤이어 1969년 발표된 T-600 역시 인기를 얻었다. 사실 이 글을 접하실 네티즌들 대부분은 이 코너를 통해 T-600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게다가 T-2000은 더욱 생소할 지 모른다. 그런데 T-2000이라는 이름은 더욱 영화의 터×네이터와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때까지 T-600과 T-2000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T-2000은 지금의 2.5톤 트럭 정도 크기의 3륜차였다.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 쓴 연탄배달 트럭이나, 커다란 탱크로리를 실은 분뇨수거차 등으로 맹활약(?)했었다. 물론 이런 특수(!) 용도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장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은 기아자동차가 회사이름을 「기아산업」에서 「기아자동차」로 바꾸었던 1990년에 발행한 책자「起亞의 歷史」에 나오는 T-2000의 생산라인의 모습인데, 위쪽에 걸려있는 'T-600 생산개시'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T-2000 트럭과 또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철저하게 기능적인 소형 화물차 T-600
적재정량이 0.5톤(500kg)이었던 소형 트럭 T-600 역시 T-2000과 함께 많은 활약을 했는데, 작은 차체에서 나오는 기동성으로 좁은 골목길까지 빵, 연탄, 쌀 등의 갖가지 서민 생필품 배달은 물론 '용달(用達)'이라는 개인화물수송사업의 시초가 되기도 하여 '용달차'라고 불리기도 했다. T-600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600cc(정확히는 577cc)의 배기량에 20마력을 내는 V형 2기통의 공랭식 엔진을 객실과 적재함 사이의 차체 중앙에 얹었고(놀랍게도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은 개념의 미드쉽 구조이다^^), 최고속도는 시속 75km이었다고 한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5년 동안 약 7,726대가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약 서너 대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중 한 대는 교통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다.^^
T-600을 보면 자동차로서 최소한의 구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적재함과 캐빈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지만, 양쪽 문의 유리는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고 손으로 직접 잡아 올리거나 내리게 되어있다. 요즘은 경승용차에까지도 전동식 유리창이 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방음장치는 물론 실내의 바닥에도 아무 것도 깔려있지 않은 그야말로 철저한 기능 우선의 소형 화물차이다.
바퀴는 3륜차이니 당연히 3개이겠지 하겠지만, 바퀴는 모두 네 개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3륜차인데 바퀴가 넷이라니? 나머지 하나는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예비용 바퀴(spare tire)이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네 바퀴 달린 보통의 차들도 바퀴가 모두 다섯 개이다. 혹자는 우스개 소리로 「삼강오륜」에서 오륜이 예비용 바퀴까지 모두 다섯 개의 바퀴가 있는 오륜(五輪)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원래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자동차 바퀴와는 전혀 상관없는 중국 전한(前漢) 때의 유학자(儒學者) 동중서(董仲舒)가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하여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을 논한 데서 유래된 윤리와 도덕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즈음 네 바퀴 달린 승용차들은 이제 정말 네 개의 바퀴만을 가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용 타이어는 차에 달린 것과 똑같은 휠과 타이어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그 무게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템포러리 타이어(temporary tire)라고 불리는 얇고 가벼운 사실상의 '임시용' 타이어가 들어간다. 물론 외국 메이커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다. 그러니 한 대의 자동차에서 제대로 된 바퀴는 모두 네 개인 것이다.
30년이 넘는 과거의 자동차가 되어버린 소형 화물차 T-600은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았던 한국의 '왕눈이'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혹자는 만약 지구의 모든 남자들이 영화배우 아놀×슈왈×x네거처럼 건장하고, 모든 여자들은 여배우 캐×린 제타 ×스처럼 매력적이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지 모른다. 그러나 거리가 온통 모두 똑같은 아놀× 와 캐×린 같은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결국 바닷가의 모래와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만약 그 모래알 중 둥글지 않고 네모난 모래알이 하나 있다면, 그는 모래알 세계의 아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세계에는 무척이나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한편으로 일명 '왕눈이'라는 별명으로 구분될 법한 얼굴을 가진 차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왕눈이들도 결코 같지 않다. 이미 이 코너의 초반에 다루었던 오스틴 힐리나 메셔슈미트 같은 귀여운 얼굴의 왕눈이에서부터 시작해 포르쉐와 같은 서늘한 이미지의 고성능 왕눈이까지, 모두가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를 가졌지만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포르쉐는 둥근 헤드램프를 가진 911 시리즈 이외에도 1980년대에는 둥근 헤드램프가 강조되지 않는 스타일을 가진 924, 928, 944 등의 모델들을 발표했지만,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 90년대에 시작된 박스터 시리즈를 비롯한 신형 모델들이 거의 모두 둥근 헤드램프를 가진 귀여운(?) 911 모델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단지 크고 둥그런 헤드램프를 가진 '왕눈이스러운' 차들 또한 적지 않은데, 이처럼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가 많았던 것은 스타일 적인 이유보다는 빛을 반사하고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사경과 렌즈의 제작 시 원형의 형태가 가장 만들기 쉬운 형태라는 기술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 와서 매우 다양해진 모양의 램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 기본구조의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 원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왕눈이 자동차들의 특징에서 공통적인 것은 앞모습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의 비중이 적거나 또는 그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4각형 헤드램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헤드램프는 원형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큰 차에서는 '왕눈이'의 인상은 들지 않는다. 앞서의 몇 차종들은 모두가 앞모습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동그란 헤드램프만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빛내고 있을 따름이다.
기아산업의 3륜차 생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차들 중에 왕눈이는 몇 가지나 될까? 사실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를 쓴 것으로 따지자면 옛날은 물론 지금도 승용차와 트럭에서 그 종류는 꽤 될 것이지만, 그들 모두가 왕눈이인 것은 아니다. '왕눈이'라는 소릴 들으려면 적어도(마치 요즘의 어느 개그맨의 말투 같기도 하다) 둥근 모양의 헤드램프 형태가 차체의 형태에 묻히지 않고 그야말로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왕눈이의 자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우리 나라 왕눈이에는 기아 마스터 T-600이 있다. T-600이라는 차 이름으로만 본다면 마치 영화 속의 터×네이터 이름처럼 보이기도 해 생소하지만, 이 차는 1969년부터 기아산업에서 만들어진 3륜 소형 화물차(보통 용달차〈用達車〉라고 했었다)이다.
지금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회사가 된 기아자동차는 1990년까지는 기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다. 기아산업의 모태가 된 경성정공은 1944년에 설립되었고, 6.25사변을 겪는 동안 '3000리호'로 대표되는 자전거를 만들면서 회사 이름을 기아산업으로 바꾸게 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성정공의 창업자인 김철호 사장은 회사 이름을 바꿀 때, 기아(起亞)의 의미로 아시아(亞)를 일으킨다(起)는 뜻과 아울러, 기계부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어(gear)의 일본식 발음 기아(キア)에서도 힌트를 얻었다고도 한다.
기아산업은 3000리호 자전거 생산에 이어 2륜차(오토바이)를 일본의 혼다와 기술 제휴하여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1962년에는 화물차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동양공업과 제휴하였다. 동양공업은 지금은 포드에 인수된 일본 메이커 마쯔다(Mazda)의 본래 이름인데, 마쯔다 라는 이름을 동양공업이라는 이름과 혼용하다가 1980년대 초 이들이 소형 승용차 수출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마쯔다(Mazda)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62년에 기아산업과 제휴하면서도 마쯔다라는 이름을 썼으나, 이 때에는 영어로 마스터(Master)라고 음역해서 쓰게 되었다. 물론 이들이 마쯔다를 마스터로 음역한 것이 자신들이 기아산업에게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주는 주인(master)이라는 오만한(?)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 아니 상당 기간동안 기아산업의 차량에는 기아마스터(KIAMASTER)라는 긴 이름이 붙여졌었다.
기아산업은 1962년 1월에 K-360이라는 소형 3륜차를 내놓았다. 총 배기량 356cc의 경3륜차인 K-360은 1961년 12월에 시작품 8대를 제작하는데 성공하고 1962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요가 부진하여 첫 해에 67대, 다음 해인 1963년에 75대, 1964년에 23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어 1963년 3월에는 두 번째 3륜차 T-1500을 내놓았지만, 역시 판매가 부진하여 첫 해에 116대, 다음 해인 1964년에 겨우 10대가 팔렸다. 이들 차종의 판매가 부진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역시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기아산업은 1966년이 되자 마쯔다의 여러 차종을 분석한 끝에 다시 중형급 T-2000과 소형 T-600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여 마침내 T-600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1967년 T-2000이 발매되자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고, 뒤이어 1969년 발표된 T-600 역시 인기를 얻었다. 사실 이 글을 접하실 네티즌들 대부분은 이 코너를 통해 T-600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게다가 T-2000은 더욱 생소할 지 모른다. 그런데 T-2000이라는 이름은 더욱 영화의 터×네이터와 비슷한 느낌의 이름이다. 필자는 초등학교 때까지 T-600과 T-2000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T-2000은 지금의 2.5톤 트럭 정도 크기의 3륜차였다.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 쓴 연탄배달 트럭이나, 커다란 탱크로리를 실은 분뇨수거차 등으로 맹활약(?)했었다. 물론 이런 특수(!) 용도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장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은 기아자동차가 회사이름을 「기아산업」에서 「기아자동차」로 바꾸었던 1990년에 발행한 책자「起亞의 歷史」에 나오는 T-2000의 생산라인의 모습인데, 위쪽에 걸려있는 'T-600 생산개시'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T-2000 트럭과 또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철저하게 기능적인 소형 화물차 T-600
적재정량이 0.5톤(500kg)이었던 소형 트럭 T-600 역시 T-2000과 함께 많은 활약을 했는데, 작은 차체에서 나오는 기동성으로 좁은 골목길까지 빵, 연탄, 쌀 등의 갖가지 서민 생필품 배달은 물론 '용달(用達)'이라는 개인화물수송사업의 시초가 되기도 하여 '용달차'라고 불리기도 했다. T-600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600cc(정확히는 577cc)의 배기량에 20마력을 내는 V형 2기통의 공랭식 엔진을 객실과 적재함 사이의 차체 중앙에 얹었고(놀랍게도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은 개념의 미드쉽 구조이다^^), 최고속도는 시속 75km이었다고 한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5년 동안 약 7,726대가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약 서너 대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그 중 한 대는 교통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다.^^
T-600을 보면 자동차로서 최소한의 구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적재함과 캐빈은 철제로 만들어져 있지만, 양쪽 문의 유리는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고 손으로 직접 잡아 올리거나 내리게 되어있다. 요즘은 경승용차에까지도 전동식 유리창이 되어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방음장치는 물론 실내의 바닥에도 아무 것도 깔려있지 않은 그야말로 철저한 기능 우선의 소형 화물차이다.
바퀴는 3륜차이니 당연히 3개이겠지 하겠지만, 바퀴는 모두 네 개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3륜차인데 바퀴가 넷이라니? 나머지 하나는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예비용 바퀴(spare tire)이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네 바퀴 달린 보통의 차들도 바퀴가 모두 다섯 개이다. 혹자는 우스개 소리로 「삼강오륜」에서 오륜이 예비용 바퀴까지 모두 다섯 개의 바퀴가 있는 오륜(五輪)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원래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자동차 바퀴와는 전혀 상관없는 중국 전한(前漢) 때의 유학자(儒學者) 동중서(董仲舒)가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하여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을 논한 데서 유래된 윤리와 도덕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즈음 네 바퀴 달린 승용차들은 이제 정말 네 개의 바퀴만을 가지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용 타이어는 차에 달린 것과 똑같은 휠과 타이어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그 무게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템포러리 타이어(temporary tire)라고 불리는 얇고 가벼운 사실상의 '임시용' 타이어가 들어간다. 물론 외국 메이커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다. 그러니 한 대의 자동차에서 제대로 된 바퀴는 모두 네 개인 것이다.
30년이 넘는 과거의 자동차가 되어버린 소형 화물차 T-600은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았던 한국의 '왕눈이'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