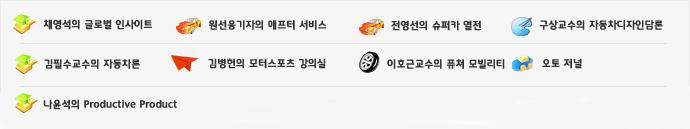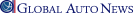카레이싱과 스폰서십의 세계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11-12-28 12:07:56 |
본문
스포츠 마케팅의 진수라고 불리며 최고의 홍보효과와 파급력을 자랑하는 F1 그랑프리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경주는 팀 운영, 드라이버의 모든 움직임이 치밀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아래 관리된다. 자금이 있어야 빠르고, 빨라야 돈을 벌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터스포츠의 세계에선 헝그리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팀 운영자금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로 충당된다. 자동차경주의 주인공인 자동차회사나 타이어 메이커,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광고에 이용하려는 일반 기업의 후원금이 주된 돈줄이다. 이 때문에 경주차, 드라이버의 유니폼, 서킷의 주요 시설물 등 눈에 띄는 모든 곳이 기업의 상표로 도배되고 있다. 심지어 서킷 바닥에 상표를 그리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노면이 미끄러워진다는 항의에 따라 지금은 활용되지 않는다. 드라이버가 입는 것, 마시는 것, 착용하는 것 등은 모두 스폰서에 따라 결정된다. 심지어 우승 뒤 시상대에서 터뜨리는 샴페인까지 돈을 내는 후원사의 제품일 정도다.
팀들이 처음부터 남의 돈을 받아 레이스를 치렀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 자동차경주는 대부분 돈 많은 귀족이나 갑부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메이커에서 직접 참가하는 워크스 팀 외에, 대부분의 프라이비터는 돈 많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차를 사서 팀을 꾸리고 직접 드라이버로 활동하거나 실력 좋은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유럽에서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큰 타격이었지만 담배회사가 떠난 자리엔 전자회사나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꿰차고 들어앉았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야후’가 프로스트를 후원하는 것을 비롯해 파나소닉, 휴렛팩커드 등의 업체들이 스폰서로 나섰고 이 같은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가끔은 엉뚱한 스폰서가 나타나기도 했다. 관광객 증가를 노린 말레이시아는 2000년 중반 자우버팀에 쿠알라룸푸르 홍보문구를 넣는 타이틀 스폰서를 했다. 이는 국가정부가 F1 후원사로 나선 첫 번째 사례다. F1을 통해 영화를 홍보하기도 했다. 2005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제작사가 레드불 팀에 후원했다. 당시 연료를 보충하고 타이어를 손보는 미캐닉들이 영화 속 캐릭터인 다스베이더와 클론 병사의 옷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되었다.
F1 팀은 이처럼 굵직한 타이틀 스폰서 말고도 10여 개 이상의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 작은 스폰서들은 연료, 옷, 전자부품 등을 팀에 공급하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가로 존을 지불한다. 싼값이라 해도 현물을 포함, 수백억 원은 내야 한다. 운전석 광고(4,100만~5,000만 달러)와 엔진 커버(3,500만~4,000만 달러), 뒷날개(1,600만 달러) 등 9군데에 붙는 스폰서 비용만 총 1억5,000만 달러. 경기마다 12개팀 머신이 수십 억 달러짜리 광고판으로 변신하는 셈이다.
자동차경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F1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레이싱의 파급력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F1 그랑프리를 보는 관중과 TV 시청자의 수는 올림픽, 월드컵에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대회를 가리켜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라고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자사의 상표를 알리거나 물건을 팔고 싶은 기업들에게 이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는 없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달리 F1은 20차례나 치러진다. 많은 돈을 지불해 후원사가 되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 관련 기업의 경우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을 카레이싱을 통해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랑프리 팬들은 자동차 엔진오일 하나를 교체할 때도 페라리 팀이 쓰는 쉘 오일이나 윌리엄즈 팀이 쓰는 캐스트롤 엔진오일 등 경기에 참가한 후원사 제품을 선호한다.

결국 팀 운영자금은 대부분 기업의 투자로 충당된다. 자동차경주의 주인공인 자동차회사나 타이어 메이커, 그리고 모터스포츠를 광고에 이용하려는 일반 기업의 후원금이 주된 돈줄이다. 이 때문에 경주차, 드라이버의 유니폼, 서킷의 주요 시설물 등 눈에 띄는 모든 곳이 기업의 상표로 도배되고 있다. 심지어 서킷 바닥에 상표를 그리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노면이 미끄러워진다는 항의에 따라 지금은 활용되지 않는다. 드라이버가 입는 것, 마시는 것, 착용하는 것 등은 모두 스폰서에 따라 결정된다. 심지어 우승 뒤 시상대에서 터뜨리는 샴페인까지 돈을 내는 후원사의 제품일 정도다.
팀들이 처음부터 남의 돈을 받아 레이스를 치렀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 자동차경주는 대부분 돈 많은 귀족이나 갑부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메이커에서 직접 참가하는 워크스 팀 외에, 대부분의 프라이비터는 돈 많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차를 사서 팀을 꾸리고 직접 드라이버로 활동하거나 실력 좋은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유럽에서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큰 타격이었지만 담배회사가 떠난 자리엔 전자회사나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꿰차고 들어앉았다.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인 ‘야후’가 프로스트를 후원하는 것을 비롯해 파나소닉, 휴렛팩커드 등의 업체들이 스폰서로 나섰고 이 같은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가끔은 엉뚱한 스폰서가 나타나기도 했다. 관광객 증가를 노린 말레이시아는 2000년 중반 자우버팀에 쿠알라룸푸르 홍보문구를 넣는 타이틀 스폰서를 했다. 이는 국가정부가 F1 후원사로 나선 첫 번째 사례다. F1을 통해 영화를 홍보하기도 했다. 2005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3’의 제작사가 레드불 팀에 후원했다. 당시 연료를 보충하고 타이어를 손보는 미캐닉들이 영화 속 캐릭터인 다스베이더와 클론 병사의 옷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되었다.
F1 팀은 이처럼 굵직한 타이틀 스폰서 말고도 10여 개 이상의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 작은 스폰서들은 연료, 옷, 전자부품 등을 팀에 공급하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가로 존을 지불한다. 싼값이라 해도 현물을 포함, 수백억 원은 내야 한다. 운전석 광고(4,100만~5,000만 달러)와 엔진 커버(3,500만~4,000만 달러), 뒷날개(1,600만 달러) 등 9군데에 붙는 스폰서 비용만 총 1억5,000만 달러. 경기마다 12개팀 머신이 수십 억 달러짜리 광고판으로 변신하는 셈이다.

자동차경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F1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레이싱의 파급력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F1 그랑프리를 보는 관중과 TV 시청자의 수는 올림픽, 월드컵에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대회를 가리켜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라고 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자사의 상표를 알리거나 물건을 팔고 싶은 기업들에게 이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는 없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달리 F1은 20차례나 치러진다. 많은 돈을 지불해 후원사가 되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 관련 기업의 경우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을 카레이싱을 통해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랑프리 팬들은 자동차 엔진오일 하나를 교체할 때도 페라리 팀이 쓰는 쉘 오일이나 윌리엄즈 팀이 쓰는 캐스트롤 엔진오일 등 경기에 참가한 후원사 제품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