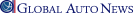데스크 | 현대/기아차, 통합 시너지 효과 다음 단계는? |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
승인 2004-06-03 14:31:12 |
본문
현대/기아차, 통합 시너지 효과 다음 단계는?
내년에는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공장에서도 생산된다. 지난 2002년 4월 16일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시에서 기공식이 있은 후 3년 만이다. 현대자동차는 3년 동안 모두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곳에서 생산될 차는 싼타페와 EF쏘나타의 후속 모델이다.
그것도 KD(Knock Down;완전조립)나 CKD(Completely Knock Down;부분조립)방식의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엔진,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장 등 자동차 제작 및 조립의 전 과정과 각종 시험 테스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건설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 현대, 기아자동차의 기술연구소 및 디자인연구소와 연계해 연구개발, 현지생산과 판매 등 완전한 현지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런 현지화 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 온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왜 해외에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현지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통상압력을 피하고 환율 리스크를 줄이며 나아가 본격적인 글로벌 메이커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계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글로벌 추구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같은 방향이지만 추구하는 방법과 현상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이 주도를 해 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소형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차의 상품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1980년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출만 무려 500만대에 달해 내수를 웃돌았고 1985년에는 673만대의 수출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8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생산대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에 따라 세계 각 나라들은 일본차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져 일본차 업체들은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만했다. 그래서 통상압력으로 무역마찰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1981년 이래 일본차의 미국수출에 대한 승용차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한 것이다. 물론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실시되었다. 수입하는 지역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쪽에서 알아서 일정대수만 팔겠다는 웃지 못할 희극이 전개된 것이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자율규제는 `유럽 또는 미국의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등에게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대수를 자랑하던 미국으로서도 일본차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해마다 자율규제 대수는 변화했지만 무려 15년이나 지속이 되다가 1994년에 가서야 폐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업체들은 수출 대수의 제한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는 수출 차종의 주력 모델을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로 인해 같은 대수를 수출하더라도 매출액은 훨씬 증가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일본 업체들은 1980년대 중반의 엔고의 영향 등으로 인해 국내 집중 생산체제에서 국제적인 생산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9년에는 북미의 현지생산공장 대부분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유럽에도 영국공장(1986년 닛산, 1992년 혼다, 토요타 등)을 시작으로 네델란드에는 미쓰비시가 볼보와 현지합병으로 1995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은 80% 이상이 일본차가 점령하고 있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M & A의 열풍이 불 때 일본의 토요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 힘으로 최근 들어서도 영국과 프랑스 공장의 확장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에 직접 투자해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하는 일본 업체들과는 달리 미국 업체들은 현지 브랜드를 매수하는 방법을 써왔다. 워낙에 브랜드의 통합업체인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캐딜락을 비롯해 폰티악, 올즈모빌, 뷰익, 시보레, 새턴, GMC 등 미국 내에서도 브랜드의 복합체인 GM은 해외에서는 스웨덴의 사브를 비롯해 영국의 복스홀, 독일의 오펠, 이탈리아의 피아트, 일본의 스즈키와 이스즈, 호주의 홀덴, 그리고 최근의 대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포드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의 볼보를 시작으로 영국의 재규어와 랜드로버, 아스톤 마틴, 일본의 마쓰다 등 쟁쟁한 브랜드들을 매수했다. 크라이슬러만 역으로 독일의 메르세데스에게 합병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의 글로벌화의 목적은 규모의 경제 확보와 생산코스트의 절감이 가장 큰 것이다. 특히 플랫폼 공유화를 통한 개발비용의 절감과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GM은 플랫폼을 만들어 사브와 오펠, 복스홀 등에 공급하고 있고 포드도 재규어의 S 타입과 링컨 LS를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토요타가 가장 앞서 있다. 토요타는 플랫폼을 같은 토요타 브랜드뿐 아니라 GM이나 폭스바겐 등 세계적 메이커들에까지 공급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토요타는 기왕에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들에 새로운 브랜드만을 부여해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낸 렉서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또한 여러 번의 모델 체인지를 거치기는 했지만 단일 브랜드로 2,000만대 이상의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카롤라는 미국 토요타의 현지공장에서 폰티악 바이브라는 이름으로 생산해 GM에 OEM으로 납품하고 있을 정도이니 토요타의 힘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물론 이런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가지가 아니다.
브랜드를 매수하는 미국업체와 현지공장 건설에 비중을 둔 일본 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이 지금은 어느정도 진정이 된 상태다. 오히려 골치아픈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BMW와 로버의 관계에서 학습했다. 그 때문에 피아트와 미쓰비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쌍용자동차도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더군다가 쌍용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와는 거리가 멀어 우리 생각처럼 누가 선뜻 제값을 주고 사려들지 않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대국 미국에 현지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사라질 뻔했던 대우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GM산하로 들어가 있다. 대우자동차를 매각할 당시 국부유출이니 하청공장이니 호들갑도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한 결과다.
지금은 그런 논란보다는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R&D센터 통합과 플랫폼 공유 등으로 인한 효과는 이제 점차 그 힘을 다해가고 있다. 그 이후 현대와 기아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일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내년에는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공장에서도 생산된다. 지난 2002년 4월 16일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시에서 기공식이 있은 후 3년 만이다. 현대자동차는 3년 동안 모두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곳에서 생산될 차는 싼타페와 EF쏘나타의 후속 모델이다.
그것도 KD(Knock Down;완전조립)나 CKD(Completely Knock Down;부분조립)방식의 단순 조립공장이 아닌 엔진,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장 등 자동차 제작 및 조립의 전 과정과 각종 시험 테스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건설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 현대, 기아자동차의 기술연구소 및 디자인연구소와 연계해 연구개발, 현지생산과 판매 등 완전한 현지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런 현지화 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여 온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왜 해외에 투자하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현지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통상압력을 피하고 환율 리스크를 줄이며 나아가 본격적인 글로벌 메이커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계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글로벌 추구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같은 방향이지만 추구하는 방법과 현상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이 주도를 해 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소형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차의 상품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1980년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출만 무려 500만대에 달해 내수를 웃돌았고 1985년에는 673만대의 수출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8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생산대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에 따라 세계 각 나라들은 일본차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져 일본차 업체들은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만했다. 그래서 통상압력으로 무역마찰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1981년 이래 일본차의 미국수출에 대한 승용차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한 것이다. 물론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실시되었다. 수입하는 지역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쪽에서 알아서 일정대수만 팔겠다는 웃지 못할 희극이 전개된 것이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자율규제는 `유럽 또는 미국의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등에게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대수를 자랑하던 미국으로서도 일본차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해마다 자율규제 대수는 변화했지만 무려 15년이나 지속이 되다가 1994년에 가서야 폐기되었다. 그러나 일본업체들은 수출 대수의 제한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는 수출 차종의 주력 모델을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로 인해 같은 대수를 수출하더라도 매출액은 훨씬 증가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일본 업체들은 1980년대 중반의 엔고의 영향 등으로 인해 국내 집중 생산체제에서 국제적인 생산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9년에는 북미의 현지생산공장 대부분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유럽에도 영국공장(1986년 닛산, 1992년 혼다, 토요타 등)을 시작으로 네델란드에는 미쓰비시가 볼보와 현지합병으로 1995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물론 아시아 시장은 80% 이상이 일본차가 점령하고 있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M & A의 열풍이 불 때 일본의 토요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그 힘으로 최근 들어서도 영국과 프랑스 공장의 확장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에 직접 투자해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하는 일본 업체들과는 달리 미국 업체들은 현지 브랜드를 매수하는 방법을 써왔다. 워낙에 브랜드의 통합업체인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캐딜락을 비롯해 폰티악, 올즈모빌, 뷰익, 시보레, 새턴, GMC 등 미국 내에서도 브랜드의 복합체인 GM은 해외에서는 스웨덴의 사브를 비롯해 영국의 복스홀, 독일의 오펠, 이탈리아의 피아트, 일본의 스즈키와 이스즈, 호주의 홀덴, 그리고 최근의 대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포드도 예외가 아니다. 스웨덴의 볼보를 시작으로 영국의 재규어와 랜드로버, 아스톤 마틴, 일본의 마쓰다 등 쟁쟁한 브랜드들을 매수했다. 크라이슬러만 역으로 독일의 메르세데스에게 합병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의 글로벌화의 목적은 규모의 경제 확보와 생산코스트의 절감이 가장 큰 것이다. 특히 플랫폼 공유화를 통한 개발비용의 절감과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GM은 플랫폼을 만들어 사브와 오펠, 복스홀 등에 공급하고 있고 포드도 재규어의 S 타입과 링컨 LS를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토요타가 가장 앞서 있다. 토요타는 플랫폼을 같은 토요타 브랜드뿐 아니라 GM이나 폭스바겐 등 세계적 메이커들에까지 공급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토요타는 기왕에 일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들에 새로운 브랜드만을 부여해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낸 렉서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또한 여러 번의 모델 체인지를 거치기는 했지만 단일 브랜드로 2,000만대 이상의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카롤라는 미국 토요타의 현지공장에서 폰티악 바이브라는 이름으로 생산해 GM에 OEM으로 납품하고 있을 정도이니 토요타의 힘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물론 이런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가지가 아니다.
브랜드를 매수하는 미국업체와 현지공장 건설에 비중을 둔 일본 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이 지금은 어느정도 진정이 된 상태다. 오히려 골치아픈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BMW와 로버의 관계에서 학습했다. 그 때문에 피아트와 미쓰비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쌍용자동차도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더군다가 쌍용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와는 거리가 멀어 우리 생각처럼 누가 선뜻 제값을 주고 사려들지 않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대국 미국에 현지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사라질 뻔했던 대우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GM산하로 들어가 있다. 대우자동차를 매각할 당시 국부유출이니 하청공장이니 호들갑도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한 결과다.
지금은 그런 논란보다는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특히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R&D센터 통합과 플랫폼 공유 등으로 인한 효과는 이제 점차 그 힘을 다해가고 있다. 그 이후 현대와 기아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일 것인지가 궁금해진다.